
사진=류우종 기자
글감이 되어준 삶, 개인적 분노가 공적 의제로
김원영의 글쓰기는 10대부터 시작됐다. 중학교 때 용돈벌이를 위해 공모전에 글을 썼는데 덜컥 상을 받아버린 것이다. 김원영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내가 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이전까지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세상의 흐름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개인이었던 것. 그런 그의 언어에 세상이 반응했다. 세상과 그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탄력받은 그는 고등학생 때까지 상금 주는 공모전 글쓰기에 열심히 도전했다. “주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원자력 찬성이었나? 그때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찬성한다는 글도 쓰고 그랬어요. 하하하.” 나는 지금이라면 전혀 쓰지 않을 원자력 찬성 글을 열심히 써서 공모전에 응시했던 중학생 김원영, 고등학생 김원영을 열렬히 지지한다. 골형성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그는, 15살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집에만 있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탓에 병원 갈 때를 제외하곤 외출하지 않았다. “내 세계는 작은 방이 전부였다. 한쪽으로 트여 있는 미닫이문을 통해 마을의 개천과 다리가 보였다. 나는 한쪽 팔꿈치를 문턱에 올려 몸을 지지한 채 밖을 내다보았다.”(<희망 대신 욕망>)강원도 작은 시골마을에 살던 그가 처음 대면한 세상은 재활원(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이었다. 달빛만이 들어오던 작은 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배움이 열어준 신세계는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지만 그에게 재활원은 여전히 비좁은 세계였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되려는 욕망이 지금의 김원영을 있게 했을 것이란 짐작.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창 시절에 열중한 공모전 글쓰기는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다는 김원영의 간절한 마음이 닿은 하나의 기도였을지도 모른다. 자기 언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본격적인 글쓰기는 대학 때부터 시작됐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그는 언론사에 ‘장애 학생 이야기’라는 수기를 3부작으로 썼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 거창하게 말하면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내 언어로 표현됐을 때 가지는 힘과 의미도 느꼈고요.”
사진=류우종 기자
법학교과서를 쓰지 않는 이상, 장애는 나의 소재
소재는 많았다. 김원영의 삶은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했다. “(장애인으로) 매일 경험하는 분노와 좌절, 일상의 짜증과 각종 부당함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언어로 정제해서 표현하다보니 개인적 분노가 공적 의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인간 실격이란 없다”는 의제를 던지며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발견되고 구축되는지 깊은 통찰을 보여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출간 4년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저서로 꼽힌다. “인간은 신체를 훼손당할 때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특유의 욕망과 선호, 희망, 자율성으로 구성되는 개별적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당한다.”(<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그러나 나는 그보다 2010년에 출간되고 2019년에 새로 개정판이 나온 <희망 대신 욕망>을 더 좋아하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참을 수 없이 민망한 표현과 묘사, 과잉된 자의식, 자기 서사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곳곳에 보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희망 대신 욕망>에서는 나 자신을 글로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를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내 서사에 기반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한 증언이었던 셈이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꿰뚫는 하나의 통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설득하는) 글쓰기가 시작됐습니다.”2021년 출간된 <사이보그가 되다>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쓰였다. 김초엽 작가와 공동집필한 이 책에서 김원영은 과학과 기술이 다양한 신체와 감각을 지닌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해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공동작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앞선 저서들과 비슷한데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사례와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청각장애가 있는 김초엽과 지체장애가 있는 김원영의 시각은 분명 차이가 있었고 그 덕에 책은 더 많은 담론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그의 대표작엔 모두 ‘장애’가 등장한다. 물론 김원영은 장애 당사자지만 그는 ‘장애인 작가’가 아니다. 그냥 작가인데 단지 장애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는 크다. “법학교과서를 쓰지 않는 이상 제 글에서 장애는 계속 다뤄질 겁니다. 그것은 장애가 내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언가를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다만 그 창작의 배경에 제 장애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제 글에 장애가 ‘등장’하는 것뿐이죠.”*김원영, 고유함으로 출발해 세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21WRITERS②]로 이어집니다.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1787.html출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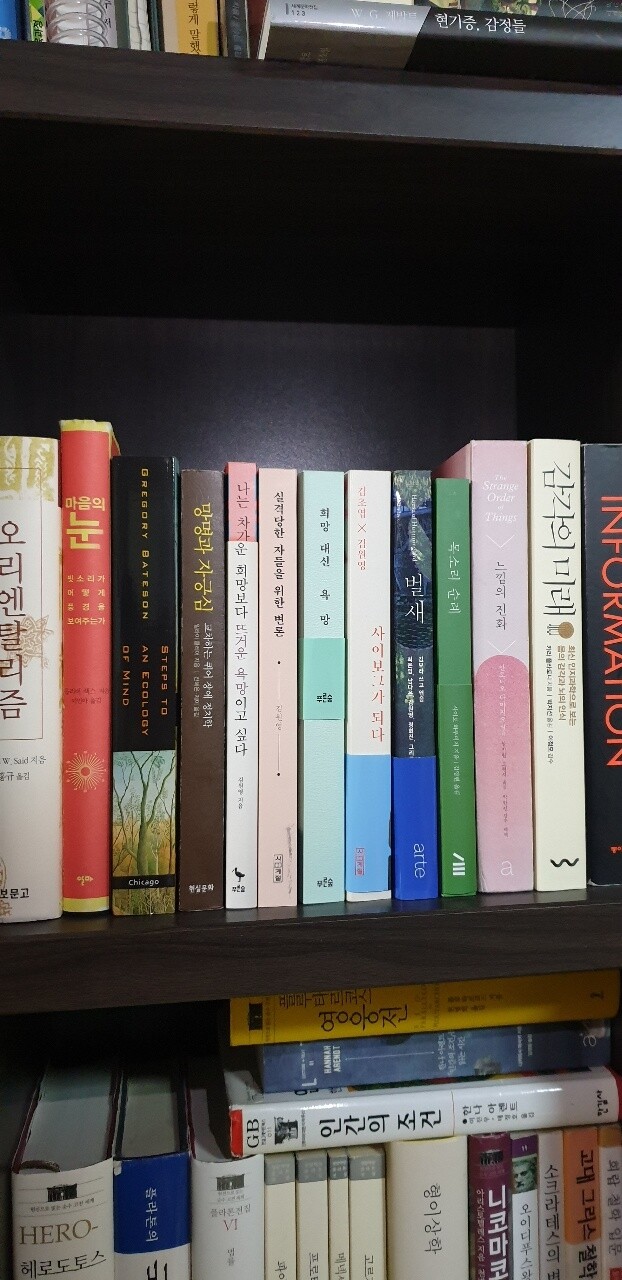
김원영 제공
추천하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