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6월 만난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 죄를 지어 벌금형을 받았으되 그들 모두는 우리가 손을 건네야 하는 이웃이다. 국회에서 벌금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날, 장발장은행이 아름답게 문을 닫는 날을 기다린다. 왼쪽 맨 밑에 놓인 사진부터 류우종 기자, 김진수 기자, 류우종 기자, 정용일 기자, 김진수 기자, 류우종 기자, 정용일 기자
기획 연재
우리 시대 ‘장발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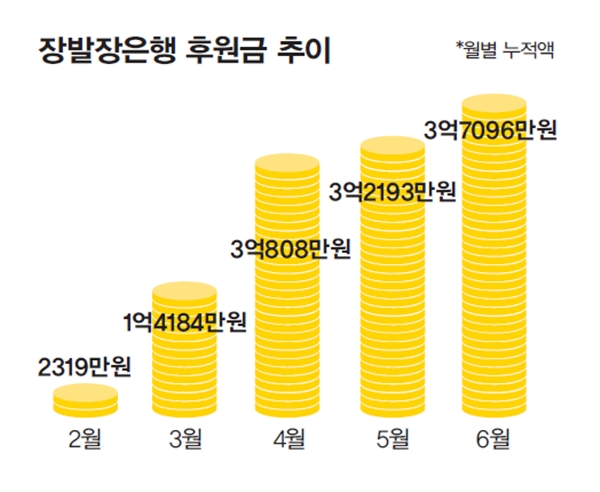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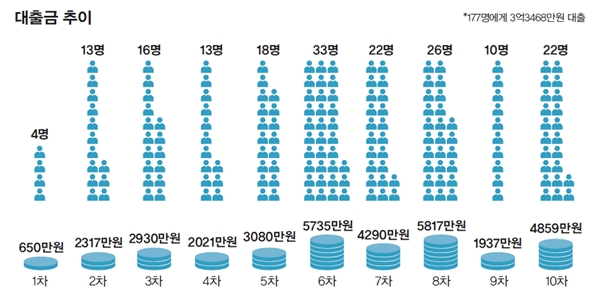
7명의 장발장을 만나고
달콤한 날을 기다리며
슬픈 여로였다.
여로(藜蘆)는 한반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나무 아래나 풀밭에서 잘 자란다. 성질이 차고 맛은 쓰다.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쓰임에 따라 약으로 구실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리라는 걸 알았다. 잘 다스리면 삶은 별보다 빛나고 아름답다. 잘못 디디면 삶은 명도 ‘0’의 갱도가 된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대 장발장들’을 연재하면서 모두 7명을 만났다. 오가는 길에서 여로를 생각했다.
고된 기로였다.
기로는 갈림길이고 갈림길은 선택을 강요한다. 처음 만난 쉰일곱의 영수씨. 그는 선택에서 번번이 패배했다. 삶의 신호등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젊어서는 수도사가 되려고 했다. 가난은 완강한 허리띠처럼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1500원짜리 봉지된장은 지금도 쓴 약같이 슬프다. 취재를 마친 뒤 그와 함께 먹은 짬뽕도 잊을 수 없다. 맵고 짜지만 달콤한 짬뽕, 그에게도 달콤한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는 선했다.
맑은 안개였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만난 마흔여섯의 철수씨. 그가 그립다. 집집마다 마당의 윗목까지 들어선 태백의 산들이 그립다. 그곳에서 그는 2~3일마다 신장 투석을 하며 견디고 있었다. 노동자였으되 제 몸보다 타인을 더 염려한 탓에 그는 고생하고 있다. 노모의 걱정이 마당에 널어놓은 두릅보다 많았다. 그래도 철수씨는 잘 웃었다. 그를 보면서 ‘맑은 안개’라는 형용모순을 생각했다. 앞을 가로막는 안개 같은 삶 앞에서 그는 맑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올여름 태백에 가련다.
아픈 먼지였다.
다섯 살 딸과 지내는 마흔 살 경희씨는 나와 동갑내기였다. 홑이불이 사르륵거리는 목소리를 가졌다. 여인이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딸은 그의 또 다른 심장이었다. 경희씨는 두 개의 심장을 품고 산다. 만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신경질적인 바람이 불었다. 미운 바람 속에 먼지가 가득했다. 위태로운 경희씨에게는 먼지도 아프다. 바람 부는 날, 경희씨가 떠오른다.
엄마 홀로 사남매를 건사하는 영수네. 고아로 자라 어머니 얼굴조차 기억 못하지만 씩씩한 석정씨. 홀어머니 모시고 당차게 미래를 설계하는 철호씨. ‘노동의 무한궤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철용씨. 이들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거울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우리를 비추어서, 시루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연대를 꿈꾸었으면 좋겠다. 켜켜이 떡이 쌓인 시루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포개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