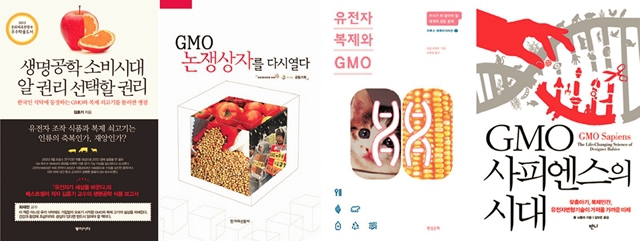
두 사람은 오랜 산책 끝에 가게에 들어가 맥주와 샌드위치를 시켰다. 식당 냅킨에 두 사람이 함께 연구할 실험 계획을 그렸다. 1년 뒤 그들은 아프리카 두꺼비의 유전자를 잘라내 대장균에 옮기는 데 성공했다. 지엠오를 가능케 하는 ‘재조합DNA기술’의 탄생이었다. 변형/조작/재조합된 유전자도 자손에게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지엠오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지엠오는 먹을거리 말고도 의약품, 화훼 등 다양한 영역에 존재한다. 최초의 지엠오는 인슐린에 적용됐다.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삽입해 의료 영역에 사용한 것이다. 파란색 카네이션도 지엠오다. 방울토마토는 비슷한 종끼리 교배해 만들었다. 지엠오가 아니다. BT옥수수는 옥수수와 전혀 다른 종인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 세포에 삽입했다. 지엠오다. 이렇듯 지엠오의 정의는 GM식품 상업화 20여 년간 “외부 유전자를 갖게 된 생물”([유전자 복제와 GMO], 오딜 로베르 지음, 심영섭 옮김, 현실문화 펴냄)을 의미했다. “어떤 생명체에 특정 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했을 때, 그 생명체를 GMO라고 부른다.”([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2013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Cas9)의 성공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외래 유전자의 삽입 없이 크리스퍼만으로 유전자를 편집해 생명체의 특정 형질을 없애거나 발현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색이 변하지 않는 버섯은 크리스퍼를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이다. ‘유전자교정작물’(GEC·Genetically Edited Crop)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GEC가 지엠오와의 ‘구별짓기’에 성공하느냐 여부는 무엇보다 상업화 문제와 직결된다. 지엠오로 분류되면 지엠오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 식품 분야 지엠오를 둘러싼 인체·환경 유해성 논쟁이 뜨거웠던 덕분에 지엠오 규제는 국제 합의를 비롯해 비교적 엄격하게 갖춰져 있다. 지엠오 개발국이자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올해 5월 크리스퍼를 활용해 만든 ‘유전자교정’ 버섯을 지엠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규제가 더 엄격한 유럽연합은 분류 결정 기한인 2015년을 넘기고도 여전히 결론을 못 내렸다. 생물학자 폴 뇌플러는 올해 출간한 책 [GMO 사피엔스의 시대](김보은 옮김, 반니 펴냄)에서 크리스퍼 기술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맞춤아기’(Designer Baby)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이제 지엠오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정의에는 누구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사회적 논의의 장과 합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정확한 정보와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