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희망 공허한 진동
눈부시게 성공하고 참담하게 실패한 <88만원 세대>
입맛에 맞춰 20대를 ‘수꼴’로 부르거나 ‘희망’으로 찬미한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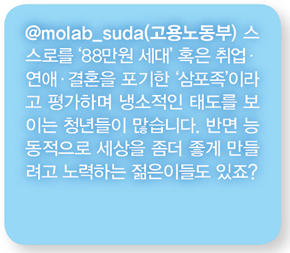 <88만원 세대>를 출간한 지 6년이 되어간 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실크 세대 사태’ 가 먼저 떠오른다. 실크 세대란 ‘실크로드 세 대’의 줄임말로 ‘88만원 세대’ 담론이 한창 유 행하던 2008년 말~2009년 초 무렵 <조선 일보>와 변희재씨가 띄우던 세대론이다. ‘88 만원 세대’라는 말 대신 ‘실크 세대’를 써야 하며, 이른바 ‘486세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 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들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 했기에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와 <88만원 세대>를 함께 썼던 우석 훈씨가 갑자기 <한겨레> 지면을 통해 변희 재와 실크 세대론을 지지한다는 글을 발표 한 것이다. 어떤 세대는 유능한데 어떤 세대 는 무능하다는 식의 유사 인종주의적 시각 으로 특정 세대를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실 크 세대론은,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 노동 의 현실을 모든 세대가 연대해 바꾸자고 주 장하는 88만원 세대론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양립 불가능하다. 나는 곧바 로 우석훈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88만원 세대>는 결코 <조선일보>류 세대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저자로서의 인연 도 거기서 사실상 끝났다.
6년이 지나 곰곰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석 훈씨가 생각한 세대론은 나의 세대론과는 달랐던 것 같다. 그의 세대론은 특정 세대 에게 선과 악의 낙인을 찍어 한껏 치켜세우 거나 세상에 둘도 없는 말종인 양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을 대체해버린다는 점에서, <조 선일보>류 세대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다. 우씨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 지식인 들이 그랬다. 촛불시위, 선거 등 중요한 정 치적 국면에서 ‘20대가 보수화되어서 그렇 다’는 식으로 20대 혐오론을 공공연히 유포 했다. 반면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직후 에는 20대가 ‘수꼴’이라 욕하던 이들이 돌변 해 20대 찬가를 불러댔다. 진보개혁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 이후 6년 동안 청년 세대에 대한 담 론은 그저 20대 혐오론과 희망론이라는 공 허한 판타지의 양극을 메트로놈처럼 오갔 을 뿐이다. 반면 2009년 대졸 초임 삭감 사 태처럼 청년 세대 전체의 삶을 국가와 기업 집단이 유린하는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툭하면 “20대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며 본 인의 진보성을 과시하던 이들은 대체 어디 에 있었는가.
최근 우석훈씨는 “20대가 책을 읽고도 싸우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돌연 <88만원 세대>를 절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명 의 저자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 다. 20대를 도매금으로 묶어 비난하며 절판 의 핑계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만, 고민 끝에 나는 절판에 동의했다. 20대 가 그 책을 읽고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사회적 역할이 이 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8만 원 세대>는 눈부시게 성공했고 참담하게 실 패했다. 애당초 ‘한 방’에 해결될 문제가 아 니었다. 88만원 세대론을 넘어서 더 깊은 고 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박권일 계간
<88만원 세대>를 출간한 지 6년이 되어간 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실크 세대 사태’ 가 먼저 떠오른다. 실크 세대란 ‘실크로드 세 대’의 줄임말로 ‘88만원 세대’ 담론이 한창 유 행하던 2008년 말~2009년 초 무렵 <조선 일보>와 변희재씨가 띄우던 세대론이다. ‘88 만원 세대’라는 말 대신 ‘실크 세대’를 써야 하며, 이른바 ‘486세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 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들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 했기에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와 <88만원 세대>를 함께 썼던 우석 훈씨가 갑자기 <한겨레> 지면을 통해 변희 재와 실크 세대론을 지지한다는 글을 발표 한 것이다. 어떤 세대는 유능한데 어떤 세대 는 무능하다는 식의 유사 인종주의적 시각 으로 특정 세대를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실 크 세대론은,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 노동 의 현실을 모든 세대가 연대해 바꾸자고 주 장하는 88만원 세대론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양립 불가능하다. 나는 곧바 로 우석훈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88만원 세대>는 결코 <조선일보>류 세대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저자로서의 인연 도 거기서 사실상 끝났다.
6년이 지나 곰곰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석 훈씨가 생각한 세대론은 나의 세대론과는 달랐던 것 같다. 그의 세대론은 특정 세대 에게 선과 악의 낙인을 찍어 한껏 치켜세우 거나 세상에 둘도 없는 말종인 양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을 대체해버린다는 점에서, <조 선일보>류 세대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다. 우씨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 지식인 들이 그랬다. 촛불시위, 선거 등 중요한 정 치적 국면에서 ‘20대가 보수화되어서 그렇 다’는 식으로 20대 혐오론을 공공연히 유포 했다. 반면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직후 에는 20대가 ‘수꼴’이라 욕하던 이들이 돌변 해 20대 찬가를 불러댔다. 진보개혁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 이후 6년 동안 청년 세대에 대한 담 론은 그저 20대 혐오론과 희망론이라는 공 허한 판타지의 양극을 메트로놈처럼 오갔 을 뿐이다. 반면 2009년 대졸 초임 삭감 사 태처럼 청년 세대 전체의 삶을 국가와 기업 집단이 유린하는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툭하면 “20대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며 본 인의 진보성을 과시하던 이들은 대체 어디 에 있었는가.
최근 우석훈씨는 “20대가 책을 읽고도 싸우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돌연 <88만원 세대>를 절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명 의 저자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 다. 20대를 도매금으로 묶어 비난하며 절판 의 핑계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만, 고민 끝에 나는 절판에 동의했다. 20대 가 그 책을 읽고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사회적 역할이 이 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8만 원 세대>는 눈부시게 성공했고 참담하게 실 패했다. 애당초 ‘한 방’에 해결될 문제가 아 니었다. 88만원 세대론을 넘어서 더 깊은 고 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박권일 계간 편집위원
멘토야 사기꾼이야 ‘거짓 멘토링’으로 고소득 올리는 멘토들 차라리 그들에게 갈 돈을 사회구조 개선에 쓰자 [%%IMAGE3%%]“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 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클럽에서 자신을 유 혹해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돈을 뜯 긴 뒤 여성을 멀리하게 된 미국 래퍼 고 투팍 (2PAC)이 남긴 말이다. 모든 여성이 사기꾼 은 아닐 텐데, 너무 호되게 당했나보다. 여성 을 상대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근 걸 보니 말이다. 좀 성급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 역시 마음을 닫은 대상이 있기에 그 심정 을 알 것도 같다. 일부 ‘사기꾼 스멜(smell) 멘 토’들 때문에 언짢았던 나는, 멘토를 자청하 거나 남들이 멘토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 모 두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생각하는 ‘사기꾼 스멜 멘토’는 현 체 제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이다. 이를테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극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을 이 루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저성장 시대다. 점점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내 내 긴 노동시간에 적은 임금만을 받으며 착 취당할 거라는, 그나마도 몇십 년 못하고 잘 릴 거라는 불안감. 이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를 갖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모두가 죽어 라 노력하니 스펙 과잉 시대가 되고, 들인 돈 은 많은데 본전도 못 찾는 이가 늘어나고. 2007년 발간된 책 <88만원 세대>는 이 런 구조적 문제를 생생히 보여줬고, 그 생생 함 덕인지 청년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쓰게 됐다. 이 제는 거의 클리셰다. 이 용어가 진부해진 만 큼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건 정설 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걱정을 좀더 하 게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삶의 불안정성은 여 전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불안하니 찾 나보다. 멘토들 찾아가 얘기 듣고 힐링을 받 거나 꿈을 꾸거나 하며 희망과 위안을 구하 나보다. 그리고 멘토에게 힘 얻어 열심히 자 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달려간다. 가자! 모두 가 향하는 그곳으로! 거기에 뛰어들어 월 88 만원 벌 동안(혹은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그보다 못 벌 동안) 멘토님들은 연 10억원씩 버실 테다. 누가 멘토에게 10억원을 주는가. 기업에 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한 멘토는 회당 몇백만원씩 번다 ‘카더라’. 청년들 역시 코 묻 은 돈으로 멘토들이 내는 책을 사준다. 차라 리 그 비용이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 쓰 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팍의 말을 빌리 자면, ‘청년들은 멘토를 멀리하고 ‘자위’를 하 는 게 낫습니다’. 청년 당사‘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자는 말이다. ‘자외’도 좋다. ‘자’발적으로 ‘외’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 울이자.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자. 또한 ‘자위’와 ‘자외’가 축적되면 체제의 모순 을 고발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정책 입안자 면전에 함께 내던지자. 그러니까 모두 제가 만드는 <월간잉여>에 투고를….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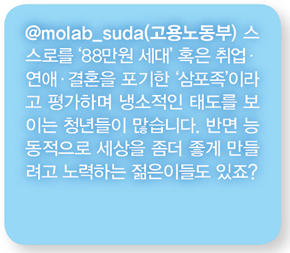
멘토야 사기꾼이야 ‘거짓 멘토링’으로 고소득 올리는 멘토들 차라리 그들에게 갈 돈을 사회구조 개선에 쓰자 [%%IMAGE3%%]“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자 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클럽에서 자신을 유 혹해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돈을 뜯 긴 뒤 여성을 멀리하게 된 미국 래퍼 고 투팍 (2PAC)이 남긴 말이다. 모든 여성이 사기꾼 은 아닐 텐데, 너무 호되게 당했나보다. 여성 을 상대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근 걸 보니 말이다. 좀 성급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 역시 마음을 닫은 대상이 있기에 그 심정 을 알 것도 같다. 일부 ‘사기꾼 스멜(smell) 멘 토’들 때문에 언짢았던 나는, 멘토를 자청하 거나 남들이 멘토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 모 두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에까지 이르렀다. 내가 생각하는 ‘사기꾼 스멜 멘토’는 현 체 제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이들이다. 이를테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극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성공’을 이 루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저성장 시대다. 점점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내 내 긴 노동시간에 적은 임금만을 받으며 착 취당할 거라는, 그나마도 몇십 년 못하고 잘 릴 거라는 불안감. 이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를 갖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모두가 죽어 라 노력하니 스펙 과잉 시대가 되고, 들인 돈 은 많은데 본전도 못 찾는 이가 늘어나고. 2007년 발간된 책 <88만원 세대>는 이 런 구조적 문제를 생생히 보여줬고, 그 생생 함 덕인지 청년 현실을 얘기할 때마다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쓰게 됐다. 이 제는 거의 클리셰다. 이 용어가 진부해진 만 큼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건 정설 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걱정을 좀더 하 게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삶의 불안정성은 여 전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불안하니 찾 나보다. 멘토들 찾아가 얘기 듣고 힐링을 받 거나 꿈을 꾸거나 하며 희망과 위안을 구하 나보다. 그리고 멘토에게 힘 얻어 열심히 자 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달려간다. 가자! 모두 가 향하는 그곳으로! 거기에 뛰어들어 월 88 만원 벌 동안(혹은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그보다 못 벌 동안) 멘토님들은 연 10억원씩 버실 테다. 누가 멘토에게 10억원을 주는가. 기업에 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한 멘토는 회당 몇백만원씩 번다 ‘카더라’. 청년들 역시 코 묻 은 돈으로 멘토들이 내는 책을 사준다. 차라 리 그 비용이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 쓰 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팍의 말을 빌리 자면, ‘청년들은 멘토를 멀리하고 ‘자위’를 하 는 게 낫습니다’. 청년 당사‘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자는 말이다. ‘자외’도 좋다. ‘자’발적으로 ‘외’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 울이자.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자. 또한 ‘자위’와 ‘자외’가 축적되면 체제의 모순 을 고발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정책 입안자 면전에 함께 내던지자. 그러니까 모두 제가 만드는 <월간잉여>에 투고를….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