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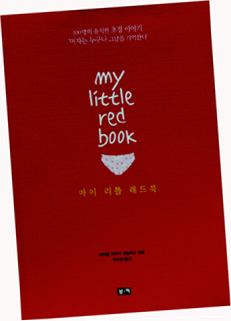
100명의 초경담을 모아 엮은 레이첼 카우터 네일버프의 <마이 리틀 레드북>.
초경에 관한 기억은 역사와 궤적을 함께하기도 한다. 뉴욕에 사는 니나는 1942년 나치를 피해 폴란드를 빠져나가다가 독일 경비대의 몸수색을 당하던 중 생리를 시작했다. 미국 버몬트에 사는 에이미는 2001년 9·11 테러 당일 삼촌이 테러로 인해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초경을 맞았다. 특별한 초경 이야기도 있다. 뉴욕에 사는 시각장애인 소녀는 계속 왜 소변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여성의 X염색체를 두 개가 아닌 한 개만 갖고 태어나 터너증후군을 판정받은 킴벌리는 프로게스테론 처방을 받은 다음에야 생리를 시작했다. 킴벌리는 “여자가 되는 것을 불평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게 생각보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100개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묘한 해방감이 느껴진다. 누가 입을 막은 것도 아닌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팔다리가 쭉 펴지는 기분이다. 동시에 잊혀졌던 자신의 초경이 떠오른다. 그때의 상황과 감정 등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글로든 말로든 엄마나 언니, 친구, 그리고 딸과 자신의 초경담을 나누고 싶어진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레이첼이 책에 썼듯이 “개인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채널을 열고 금기를 축하해야 할 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초경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여기 네 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모았다.
조물주는 여자를 대충 설계했구나!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이었다. 방에 쪼그리고 앉아 물감을 뿌리며 방학숙제로 낼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다. 문득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다. 치마 아래를 쳐다보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종이를 물들인 물감처럼, 거무스름해진 피가 얼룩덜룩한 그림을 팬티에 그려놓은 것. “아! 올 게 왔구나.”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태평스럽게 계속 그림을 그리며 초경을 맞는 내 감정을 살폈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불쑥 다가와 속옷을 적셔놓은 초경에 대해 좋은 감정은 생기지 않았다. 소변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팬티를 완전히 적셔버린 상황을 접하며 들던 첫 생각은, ‘조물주는 완전 여자를 대충 설계했구나!’.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몸으로 달의 주기를 경험하는 신비 나의 초경은, 초등학교 6학년 여름에 시작됐다. 이미 학교에서 또는 엄마나 언니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거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하겠구나 싶었다. 초경이 있기 얼마 전부터 가끔씩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곧 초경이 있을 거라고 당황하지 말라며, 당시의 담임 선생님은 패드 사용법을 가르쳐주셨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엄마와 따뜻한 유대를 가지다 1985년 1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기간이었다. 사춘기 소녀인 나는 방학 생활이 괜히 공허해서 밥만 먹으면 곧장 방 안에 틀어박혀 FM 라디오만 주야장천 청취했다.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가 좋았고, <장유진의 가요산책>이 좋았다.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좋았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특히 공개방송)가 좋았다. 라디오에 사연을 써서 빨간 우체통에 부치기도 했다. 조용필만 나오면 “용필이 오빠!”를 외치던 내 또래 아이들의 무리에서 난 열외였다. 같이 유명세를 탔던 전영록과 이용도 난 그냥 그랬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었지만 라디오 사연만은 늘 나를 가슴 설레게 했고,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이 좋았다. 그날도 난 <별밤>을 들었다. 어쩐 일인지 낮잠도 안 잤는데 새벽 방송까지 내리 듣고 나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의 컨디션은 다른 날과 조금 달랐다. 부족한 잠 탓인지 나른했다. 팬티에 소변을 지린 느낌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엷은 갈색을 한 젤리 타입의 액체가 묻어 있었다. 엄마는 이미 아침밥을 짓고 계셨다. 주방 옆이 내 방이라 고개만 빼꼼 내민 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생리인 것 같아.”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왜 나만 줄줄 새?” 내가 초경을 한 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 무렵이다. 새침하고 똑똑한 척했던 나는 엄마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초경을 멋지게 넘겨보리라 생각했다. 학교에서 나눠주었던 생리대를 떡하니 붙이고 시침 딱 떼고 있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얼마나 희열이 넘치던지. 그런데 어이없게도 엄마는 금방 내가 생리를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 바지에 선명하게 얼룩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좋다고 벌써부터 하는 거야.” 초경을 중학교 1학년에 시작한 것이 내 잘못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서러운지. 어쨌거나 내 초경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느냐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피는 생리대를 아무리 갈아도 계속 겉옷에 묻어났다. 낮은 그렇다 치고,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불에 누워야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피얼룩이 가득해서 칠칠치 못하다고 엄마에게 야단맞느라, 동생 몰래 속옷 갈아입고 겉옷 갈아입고 그 옷 얼룩 빼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다. 나는 너무 걱정됐다. 지금은 방학이라 괜찮지만, 개학한 뒤에는 이를 어쩌지? 제발 초경한 뒤 아주 오래 생리를 하지 않았으면 빌었다(초경 뒤 몇 달간의 휴지기가 있다고 배워서). 그렇게 초경이 끝나고, 나는 학교에 갔고, 다음달 어김없이 생리는 찾아왔다. 몇 번을 망설이다 언니 같은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생리를 해.” “아, 그래? 생리대 빌려줄게.” “근데 생리대를 해도 나는 계속 줄줄 새.” “잘하면 괜찮은데?” “아무리 잘해도 그래.” “어떻게 하는데?” 그제야 비밀이 풀렸다. 나는 팬티에 붙여야 할 접착 테이프를 내 몸에 붙이고 있었던 거다. 생리혈이 새지 말라고 비닐까지 갈무리된 바로 그 부분을 몸에 붙이고 있었으니 무슨 재주로 생리혈이 안 새나! 친구는 내 실수를 절대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도 엄마가 야속하다. “뭐 좋다고 벌써 시작하는 거야” 퉁바리 주지 말고, 칠칠치 못하다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생리대 사용법 좀 알려주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안 묻는 딸이나, 그렇다고 안 알려주는 엄마나 참 닮았다. 김지희 (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