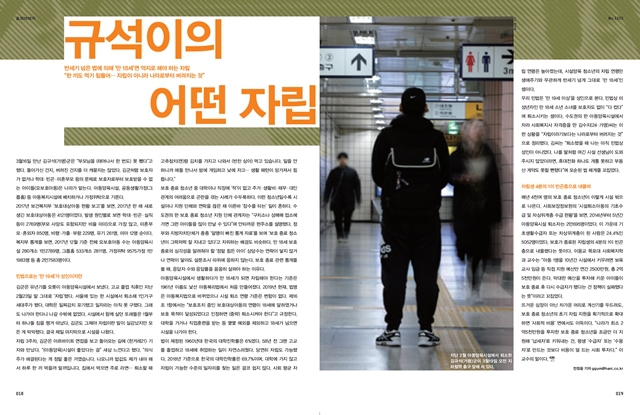팩트만 담고 사랑은 못 담았다
등록 : 2019-04-04 11:36 수정 : 2019-04-04 11:41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기사를 쓸 때 통상 법률이나 규범, 사회구조 따위의 ‘제도’에 주목한다. 쓰는 기자나 읽는 독자나 가장 익숙한 기사 쓰기 방식일뿐더러, 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면 모범답안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가끔 ‘제도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가령 마음(으로 통칭한 가치관, 태도, 종교 같은 것들)의 문제가 사안 한가운데로 ‘훅’ 들어올 때는 난감하다. ‘사실’을 다루는 기사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마음 ’의 문제를 기사로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 쓰기가 어려워서, 혹은 기사에 대한 사회 통념을 거스를 엄두가 나지 않아 슬쩍 마음의 문제를 덜어내고 제도의 문제에 집중한 기사를 마감하고 나면, 죄책감이 엄습한다. ‘사실보다 중요한 진실을 취재하고도 빠뜨린 건 아닐까?’
‘자립당한 18세 2부작’ 기사를 쓸 때, 중요한 점이긴 한데 (균형 감각이라고 주장하며) 고심 끝에 덜어낸 ‘하나’를 털어놔야겠다. 자립생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드물게 잘 자란 이들에게 공통으로 엿보이는 ‘요보호아동 해법’ 같은 게 눈에 들어왔다.
박민지(22·가명)씨를 만나기 전 내 머릿속엔 ‘기사 틀’이 있었다. 첫 줄부터 눈물 없인 읽을 수 없는 신파를 써내려갈 자신이 있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자립생이었는데, 사전에 받은 간략한 이력 속에 비극의 모든 요소가 다 있었다. 민지씨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복역 중이었고,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했다. 기록상 민지씨는 비극의 주인공이어야 했는데…. 민지씨는 청춘 시트콤 주인공 같았다. 미용실 인턴으로, 선배 디자이너인 남자친구와 하고 있는 달달한 연애담이 대화의 주를 이뤘다. 민지씨 역시 참담한 불행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 아빠(현 위탁가정 부모)가 나를 친자식보다 예뻐한다”거나 “엄마가 목사님이라 말을 예쁘게 해준다” 같은 상처 치유 비결을 전했다.
의도한 섭외가 아니었다. 가두리 그물망 같은 섭외 끝에 어렵게 인터뷰에 성공한 ‘정신력 천재’들의 뒤에는 한결같이 ‘낳은 정’을 부끄럽게 하는 ‘기른 정’을 실천한 아동양육시설 담당자가 있었다. 시설의 환경이나 지원금 액수보다 중요한 ‘사랑’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정신력 천재로 키워내고 있었다. 신미나(가명)씨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로 사례 취재에 실패한 기자를 절망시켰지만, “집사님(그룹홈 원장)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키워주셨다”는 말로 냉혹한 세상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 외무 공무원을 꿈꾸는 그룹홈 ‘똑순이’ 김예빈(가명)씨를 보살핀 원장, 퇴소생을 돕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 퇴소생 자립을 지원하는 선한울타리 사역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의 선한 마음에도 같은 ‘배후’가 있었다. 국내 여러 대형교회에서 뺨 맞고 조롱당하는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있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