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앙스가 지독히도 미묘하여,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다. 예컨대 ‘서운하다’는 배반감이나 경멸감은 아니다. ‘얄밉다’는 미움이나 혐오도 아니다. ‘민망하다’는 수치심이라고 말하기엔- 말 그대로- 민망하다. 너무 부정적 용어들만 나열했나. 예컨대 ‘귀엽다’는 ‘예쁘다’와 ‘아름답다’가 아니다. 명사도 있다. ‘호감’은 ‘매력’이 아니다. ‘썸’은 ‘사랑’이 아니다. ‘뽀뽀’는 ‘키스’가 아니다. ‘노 땡큐’는 바로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말이다. 마치 누군가가 음식을 권하자 약간은 귀엽게 거절하고자 할 때, 노 땡큐. 마치 얄미운 친구가 민망하게시리 다단계를 요구할 때, 노 땡큐. 마치 썸을 타던 남자가 조금 이른 키스를 요구할 때, 노 땡큐. 그래, 키스의 노 땡큐가 바로 뽀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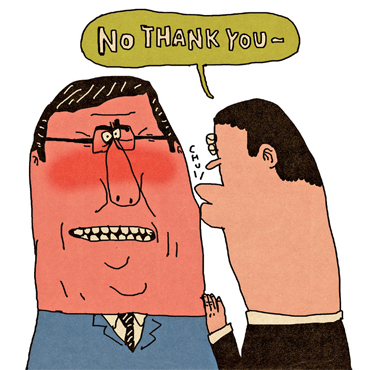 고로 노 땡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노 땡큐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희미한 상황에 매우 쓸모가 있는 저항 방식이다. 음식을 권한 우리 엄마, 그리고 혀를 권한 썸남은,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얄밉거나 서운할 뿐인 거다.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또 영원히 적이 될 필요도 없는, 엄마와 썸남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저항하는 법, 노 땡큐. 너무 치졸해 보인다고? 댓츠 노노. 당신도 오늘에만 몇 번의 노 땡큐를 했을 것이다. 내일도 몇 번의 노 땡큐를 할 것이고, 평생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경우마다, 노 땡큐 대신 저항하고 규탄하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면, 당신은 일상조차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난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노 땡큐의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의 순간, 엄마의 자궁에게 노 땡큐를 했고, 생후 20개월까지 자주 하던 잠투정, 젖투정도 모두 노 땡큐다. 노 땡큐는 우리네 삶에 가장 근원적인 저항이다. 글에도 저항의 글이 있는가 하면, 노 땡큐의 글이 있다. 영화에도 저항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노 땡큐의 영화가 있다. 기사에도 저항의 기사가 있고, 노 땡큐의 기사가 있다. 전자가 악역이 분명하다면, 후자는 악역이 희미한 경우다.
고로 노 땡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노 땡큐는 적과 동지의 구분이 희미한 상황에 매우 쓸모가 있는 저항 방식이다. 음식을 권한 우리 엄마, 그리고 혀를 권한 썸남은,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얄밉거나 서운할 뿐인 거다.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또 영원히 적이 될 필요도 없는, 엄마와 썸남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저항하는 법, 노 땡큐. 너무 치졸해 보인다고? 댓츠 노노. 당신도 오늘에만 몇 번의 노 땡큐를 했을 것이다. 내일도 몇 번의 노 땡큐를 할 것이고, 평생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경우마다, 노 땡큐 대신 저항하고 규탄하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면, 당신은 일상조차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난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노 땡큐의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의 순간, 엄마의 자궁에게 노 땡큐를 했고, 생후 20개월까지 자주 하던 잠투정, 젖투정도 모두 노 땡큐다. 노 땡큐는 우리네 삶에 가장 근원적인 저항이다. 글에도 저항의 글이 있는가 하면, 노 땡큐의 글이 있다. 영화에도 저항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노 땡큐의 영화가 있다. 기사에도 저항의 기사가 있고, 노 땡큐의 기사가 있다. 전자가 악역이 분명하다면, 후자는 악역이 희미한 경우다.
김곡 영화감독 *김곡 영화감독의 ‘노 땡큐!’를 이번호로 마칩니다.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수고해주신 김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화관에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기를 바랍니다.
노 땡큐 대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면
뉘앙스로 보자면, 노 땡큐는 저항이 아니다. 거창한 의미에서 저항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온몸을 던지는 필사적인 몸부림. 둘째, 대안에 대한 책임감. 셋째, 그룹을 조직해야 하는 사명감 혹은 연대의식. 노 땡큐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저항이다. 음식을 권하는 사람에게 온몸을 던져 아구창을 날릴 필요도 없고, 대체할 음식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썸남이 조금 이른 키스를 던질 때, 온몸으로 혀를 방어할 필요도 없고, 그를 유사강간으로 고발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수고도 없다. 뽀뽀라는 매우 우수한 노 땡큐가 있지 않은가. 노 땡큐는 전의가 살짝 아쉽지만, 그만큼 부담 없고, 또 그만큼 경쾌한 저항이다. 난 오늘도 노 땡큐를 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닦달했을 때, 이 ‘노 땡큐!’를 먼저 써야 한다며 과감하게 노 땡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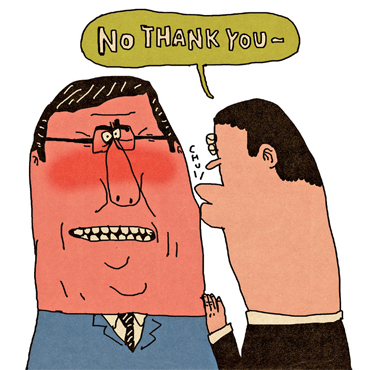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노 땡큐의 세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세기는 노 땡큐의 세기라는 것이다. 그만큼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다. 월급 안 주는 사장님은 적이 아니다. 그는 처자식이 있는 악역일 뿐이다(들뢰즈/가타리가 “자본주의엔 단 하나의 계급만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노 땡큐의 작가들이었다!). 그만큼 만수산 드렁칡 얽힌 세상이다. 노 땡큐는- 고전적 저항으로는 딱 자를 수 없을 만치- 복잡화되고 다층화된 세상을 방증한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줄어들었다고 개탄할 건 없다. 열렬한 키스와 전투적인 혀놀림이 없어도, 사랑은 여기저기 피어난다. 혐오와 경멸이 줄어든 만큼, 사랑도 늘어난 거니깐. 노 땡큐는 복잡해진 만큼 늘어난, 사랑의 너비와 끈질김을 증명하는, 이 세기의 저항법이다. 노 땡큐는 뽀뽀의 가능성을 배양해내는 인큐베이터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겨레21> 꼭지들 중에서 ‘노 땡큐!’를 유난히 사랑했던 이유다.
김곡 영화감독 *김곡 영화감독의 ‘노 땡큐!’를 이번호로 마칩니다.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수고해주신 김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화관에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