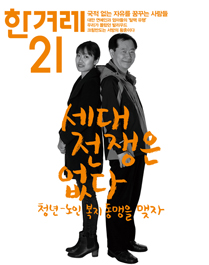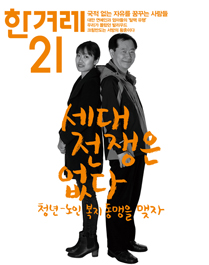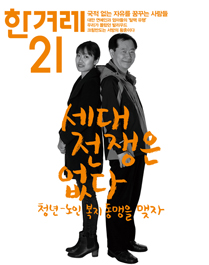1003호를 읽고
등록 : 2014-03-28 16:31 수정 :
김찬혁 발랄하나 허전했다
간첩 통조림. 팝아트를 구현한 이번 호 표지는 칙칙한 시사주간지 코너에서 단연 빛난다. 우중충한 정장들과 비주얼 속에서 저 발랄함이라니. 다만 나의 과문함 탓에 ‘이게 무슨 뜻이지?’ 통조림처럼 산적한 조작 사건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제조사명은 국정원이 끝? ‘외교문서창조’ 경제? 이것은 통조림이 아니다?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며 ‘국정원의 대량생산 능력’과 ‘유우성씨의 텅 빈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던 나는 결국 ‘독자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으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독자가 뽑은 베스트 표지 7’을 훑어봤다. 이렇게 쉬울 수가! 간명한 것이 때론 가장 아름답다고. 군더더기를 피해야 할 곳이 비단 옆구리만은 아니다.
이은지 사진과 글의 역할 분담을
특집 ‘청소노동자에게 빵과 장미를’에 쉽게 공감했던 이유는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일상을 따라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휴대용 라디오 하나로도 어머님들이 얼마나 즐거운 ‘티타임’을 보낼 수 있는지는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기사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고, 독자에게 빵과 장미가 모두 필요함을 말했다. 한국의 지방선거와 해외의 생활임금 쟁취 사례를 이용한 부연 설명도 적절했다.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어머님들의 일과는 사진으로 표현하고, 글로는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뤘다면 좋았을 듯싶다.
정현환 슬픈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던 한 진보활동가의 자살 소식을 다뤘다.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애환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고 박은지. 그녀의 죽음은 그녀보다 앞서간 다른 진보운동가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도 다른 이들처럼 현실이라는 벽 앞에 좌절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동지이자 친구였던 사람의 죽음. 그래서일까. 그녀의 묘소 앞에 흐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녹록지 않은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운동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제의 죽음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복되는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