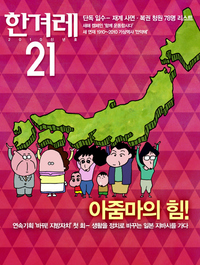
<한겨레21> 792호
개인정보 유람, 이런 빵꾸똥꾸 같으니라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빵꾸똥꾸’라고 생각하는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다. 정부기관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13자리 숫자로 이뤄진 번호가 뭐기에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수단이 되는지 불쾌한데, 그런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을 순례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한겨레21>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국정원의 패킷 감청 등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개인의 정보가 힘없이 노출되는 사례를 꾸준히 다뤄왔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개개인의 삶이 속속들이 노출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겨레21>이 꾸준히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완전정복 MB시대 수사받는 법’(769호 표지이야기)처럼 나의 개인정보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소개하는 기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편 생각해보면, 대다수 국민은 ‘내 정보는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을 거야’ ‘그거야 남 얘기겠지’라며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정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민의 무관심 혹은 방관적 태도는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1978년부터 네트워크가 생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 수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 유권자들은 행사성 이벤트를 잘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칭찬한다. 실제 시민이 참여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이가 아니라 겉보기에 치중하는 자치단체장·국회의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일본 지바시의 구마가이 도시히토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이 등장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국민의 이같은 의식 수준도 작용한 것 아닐까. <한겨레21>이 이런 문제점도 함께 짚어줬으면 좋겠다. 새해 캠페인 ‘운동합시다’에서는 시민단체를 유형별로 나누고 독자의 취향에 따라 궁합이 맞는 단체를 찾아보도록 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방자치 기획에서도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취향별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정유진 19기 독자편집위원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문화방송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