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원은 탈북자들에게 남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곳이지만, 교육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9년 7월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 모습.김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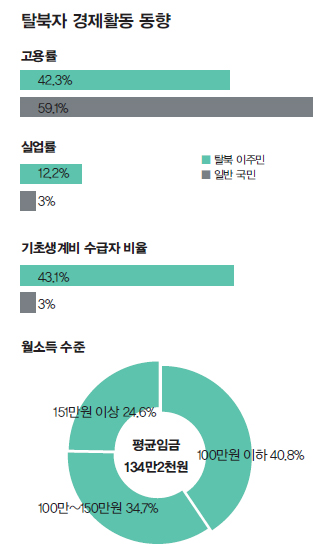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경제 교육을 재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50대 탈북 여성은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시내에 나가 쇼핑하는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카드를 주는데 뭘 사야 할지 알려주지 않아 바가지만 쓰고 온 기억이 납니다.” 카드를 사용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교육받았을까.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남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도 적응하기 힘든 자본주의의 ‘속도’에 3개월 안에 적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강연 내용을 도무지 못 알아듣고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물으면 많은 탈북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대답이다. 민간 단체들과 실질적 협력 거의 없어 탈북자는 동포이지만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다. 어떤 의미에선 외국인보다 문화적 차이가 클 수 있다. 탈북자 개개인의 경험도 모두 다르다.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물론 중국 체류 기간에 따른 경험의 격차도 크지만, 하나원 교육 기간엔 그런 차이가 모두 ‘탈북자’라는 분류 뒤로 숨는다. 하나의 강의실에서 수백 명이 함께 듣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한성무역 사건’의 피해자인 한 탈북자는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엔 누구와 남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고민을 상담하기 어려웠다. 피해를 당하기 전엔 누가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하나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고 정착 지원은 시민사회가 맡았던 독일의 사례는 ‘하나원’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통일 전 서독 정부는 이주해온 탈동독 주민에 대해 3일 정도의 인적 조사를 거쳤을 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지역사회로 내보내 주정부와 시민사회에 정착 지원을 맡겼다. 반면 국내 남북 주민 통합정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위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통합정책이) 국가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민간 단체들과 실질적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일부 비정부기구(NGO)나 종교단체는 실제 이벤트 참가와 보상에 더욱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참여정부까지만 해도 하나원 교육 일정을 줄이고 지역의 민간사회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 관점이 다시 완전히 돌아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시적 관점인데, 탈북자 정착 문제에 관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관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원 교육보단 ‘하나원 이후’의 정착 지원이 더욱 중요한 것은 명백하다. “탈북자들은 연락 올 곳이 없잖아요.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만 와도 신기해하며 센터의 상담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상담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쉽게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착 상담’이 중요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10여 년째 탈북주민을 지원해온 허영철 대구하나센터 소장은 말했다. 하나원에서 거주지를 배정받은 탈북주민들을 1년 동안 사후 지원하는 전국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의 원래 취지는 ‘원스톱 민원센터’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을 받는 하나센터는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포함해 30곳이 자리잡고 있다. ‘보이스피싱 문자’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모든 하나센터가 대구하나센터처럼 밀착 상담을 제공하긴 어렵다. 일찍부터 정부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고 꾸려온 대구하나센터에는 15~16명의 상담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센터 인력이 2~3명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시적인 자원봉사자를 뽑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결국 예산의 배분일 터. “당장은 비용이 들겠지만 전문적인 탈북자 지원 인력을 만들어두면 통일과 남북 교류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요.” 허영철 소장이 말했다. ■ 참고 문헌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의 통합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허준영·2011)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