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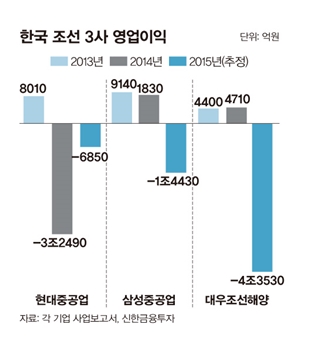
해양플랜트에 한국 조선소들이 도전하게 된 것은 2008년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부터다. 불황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사들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 상선 발주를 줄였다. 상선 발주가 줄면 조선소들은 당장 2~3년 내에 일감이 없어진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들은 해양플랜트로 눈을 돌렸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 높아지면서 글로벌 석유업체들은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데 혈안이 되었다. 수억달러에 이르는 해양플랜트들이 발주됐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마치 황금을 캐는 듯했던 해양플랜트 사업은 왜 갑자기 망가졌을까. 조선업계 주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자신감’이었다. 한국의 조선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개척한 산업이다. 정 전 회장이 유럽 선주를 찾아가 한국 화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고 당시 건설 중이던 울산 조선소에서 배를 짓겠다며 계약을 따낸 일화는 유명하다. ‘해봤어’라는 도전 정신은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힘이기도 하다. 지나친 자신감과 경영진의 연임 욕심 조선소 경영진들도 똑같이 달려들었다. 상선을 만드는 조선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해양플랜트도 도전해보자는 것이었다. 한 조선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2011년, 2012년은 미친 것 같았다. 당시 한 프로젝트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을 받아내고 이익까지 내며 성공하니까 사내에 자신감이 넘쳐났다. 해보면 된다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어려운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실력 없는 자신감은 무리수였다. 기본 설계 등 해양플랜트 경험이 부족했던 한국 조선업체들은 플랜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다. 유가가 높을 때 설계 변경 비용도 수용했던 글로벌 석유업체들은 유가가 떨어지자 차갑게 돌아섰다. 비용이 예상보다 눈더미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2012년 수주는 3~4년 뒤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국 조선회사들은 해양플랜트를 너무 쉽게 봤다. (해양플랜트에는) 전세계적으로 전문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도면을 그리고,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본 전통 있는 회사다. 그런데 한국 조선회사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도기에 치러야 할 일종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몇 년 경험을 쌓으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지나친 낙관에 지나친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축적의 시간>,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경영진들의 욕심이 꼽힌다. 덩치 큰 해양플랜트는 몇 개만 수주하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3년 임기를 보장받는 경영진에게 매출이 수억달러에 이르는 해양플랜트는 실적을 쌓는 데 좋은 먹잇감이었다. 2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해양플랜트 공사의 특성상 자신의 임기 중에 적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해서가 아니라, (경영진이)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아 조선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선소는 독(dock)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일정을 짠다. 일정대로 배를 만들어야 약속된 기한에 선주에게 배를 줄 수 있는데, 어려운 해양플랜트 건조에 욕심을 내면서 뒤 스케줄까지 모두 차질을 빚은 것이다. 건조가 지연되면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물고, 인력은 인력대로 더 투입해야 하니 예상했던 수익을 모두 까먹는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상선 발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2~3년 뒤 수만 명의 노동자를 놀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선박 수주가 끊긴 상황에서 계속 조선소를 돌려야 하는데, 당시 해양플랜트 수주를 안 하면 욕먹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조원짜리를 3조원이면 지어준다” 경영진이 매출 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수주도 등장했다. “(한국 조선 회사들은) 실제 입찰 과정에서 무조건 경쟁사보다 5~10% 깎아준다고 제안서를 써대니 원가를 보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조선회사들이 4조원짜리 해양플랜트를 3조원이면 지어준다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 (<축적의 시간>)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경영진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이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거대한 부실을 따져묻자 이들은 해양플랜트로 책임을 미뤘다. 손실을 예측할 수 없었고, 부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자신감과 욕심은 사라지고 모두 거대한 해양플랜트 뒤로 숨어버렸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