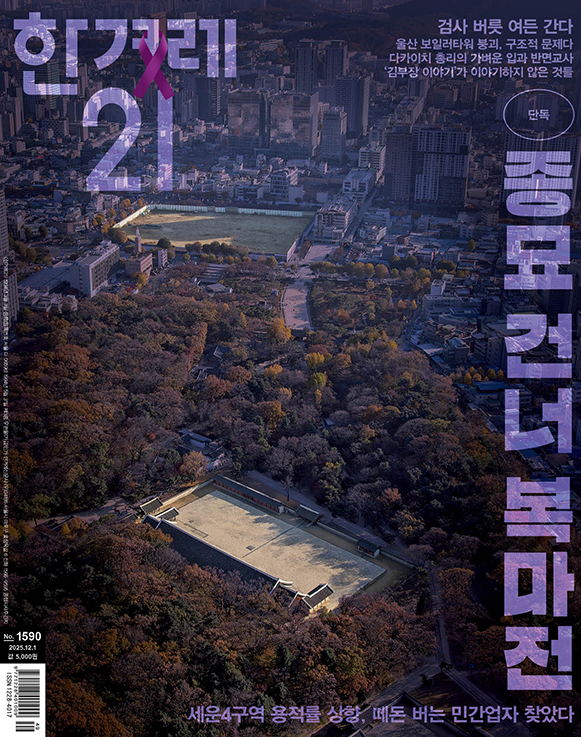병자호란 때 청군이 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국장, 그 전통의 맛을 찾아서
 청국장은 전쟁 때 단기 숙성으로 단시일 내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장이라 해 전국장(戰國醬)이라고도 하며, 청나라에서 배워 전해온 것이라 해 청국장(淸國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면 청국장은 전쟁 또는 청나라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100여해 뒤인 1760년, 유중림에 의해 보강된 <증보산림경제>에 처음으로 청국장 만드는 법이 소개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병자호란 시기 청나라 군사들로부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전도 그렇지만 지난 시기 전쟁은 군수물자, 그 가운데도 특히 군량의 운반과 그에 따른 군사들의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질풍노도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을 휩쓴 것은, 몽골군들이 햇볕에 말린 양고기·쇠고기 육포로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기동력을 충분히 발휘한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도 해석한다.
식사문제로 역사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이 정복전쟁에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식사 습관을 통해서도 분석해볼 수 있다. 조선조의 군사 편제를 보면 전투원이 100명이라면 군량 등 군물(軍物)을 운반하는 군사가 30명에 이른다. 곧 100명의 전투원을 먹이기 위해 솥단지·쌀·장작·된장·간장 등을 짊어진 군사가 30명이 딸려야 하니 공격전의 요체인 전투력과 기동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는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은 미군의 C-레이션처럼 발효된 콩을 각자 전대에 넣어 차고 다니며 끼니 대용으로 꺼내 먹음으로써 기동력을 높였다고 한다. 만주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고, 또 만주가 콩의 원산지인 것을 떠올린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청국장의 일종인 수시장(水 豆+支(합성요망) 醬) 만드는 법도 수록되어 있는데, 청나라 군사들의 발효 콩 전투식량이 사실이라면 수시장이 그것이 아닌가 유추해본다. 즉, 콩을 불그스레하게 볶아서 삶은 다음 띄워 온돌에서 말린다. 그런 뒤 때때로 꺼내어 물에 섞어 삶아 소금을 넣어 먹거나, 실을 낸 콩에 소금을 넣고 절구에 찧어 그릇에 넣었다가 끼니 때마다 숟가락으로 덜어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것이라고 한다.
청국장은 전쟁 때 단기 숙성으로 단시일 내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장이라 해 전국장(戰國醬)이라고도 하며, 청나라에서 배워 전해온 것이라 해 청국장(淸國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면 청국장은 전쟁 또는 청나라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100여해 뒤인 1760년, 유중림에 의해 보강된 <증보산림경제>에 처음으로 청국장 만드는 법이 소개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병자호란 시기 청나라 군사들로부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전도 그렇지만 지난 시기 전쟁은 군수물자, 그 가운데도 특히 군량의 운반과 그에 따른 군사들의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질풍노도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을 휩쓴 것은, 몽골군들이 햇볕에 말린 양고기·쇠고기 육포로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기동력을 충분히 발휘한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도 해석한다.
식사문제로 역사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이 정복전쟁에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식사 습관을 통해서도 분석해볼 수 있다. 조선조의 군사 편제를 보면 전투원이 100명이라면 군량 등 군물(軍物)을 운반하는 군사가 30명에 이른다. 곧 100명의 전투원을 먹이기 위해 솥단지·쌀·장작·된장·간장 등을 짊어진 군사가 30명이 딸려야 하니 공격전의 요체인 전투력과 기동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는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은 미군의 C-레이션처럼 발효된 콩을 각자 전대에 넣어 차고 다니며 끼니 대용으로 꺼내 먹음으로써 기동력을 높였다고 한다. 만주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고, 또 만주가 콩의 원산지인 것을 떠올린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청국장의 일종인 수시장(水 豆+支(합성요망) 醬) 만드는 법도 수록되어 있는데, 청나라 군사들의 발효 콩 전투식량이 사실이라면 수시장이 그것이 아닌가 유추해본다. 즉, 콩을 불그스레하게 볶아서 삶은 다음 띄워 온돌에서 말린다. 그런 뒤 때때로 꺼내어 물에 섞어 삶아 소금을 넣어 먹거나, 실을 낸 콩에 소금을 넣고 절구에 찧어 그릇에 넣었다가 끼니 때마다 숟가락으로 덜어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것이라고 한다.
 강원도 홍천에서 인제·속초 방면으로 가다 보면 길 양쪽에 청국장집이 여럿 있다. 모두가 직접 띄워 만든 옛날 청국장이라지만, 나는 그 길을 지나가면 홍천에서 인제 방향으로 17km 정도에 있는 시골청국장집(033-435-9118)에 꼭 들른다. 주인 곽노명(35)씨와 그의 어머니가 100% 홍천산 콩으로 직접 만드는 이 집의 청국장은 어릴 적 아랫목에 이불 덮어놓고 띄워 끓여주신 내 어머니의 청국장 솜씨를 그대로 빼닮았고, 값도 싸기 때문이다(청국장·된장 등 모든 메뉴 5천원).
강원도 홍천에서 인제·속초 방면으로 가다 보면 길 양쪽에 청국장집이 여럿 있다. 모두가 직접 띄워 만든 옛날 청국장이라지만, 나는 그 길을 지나가면 홍천에서 인제 방향으로 17km 정도에 있는 시골청국장집(033-435-9118)에 꼭 들른다. 주인 곽노명(35)씨와 그의 어머니가 100% 홍천산 콩으로 직접 만드는 이 집의 청국장은 어릴 적 아랫목에 이불 덮어놓고 띄워 끓여주신 내 어머니의 청국장 솜씨를 그대로 빼닮았고, 값도 싸기 때문이다(청국장·된장 등 모든 메뉴 5천원).
 그러나 어머니가 만든 청국장도 <증보산림경제>의 제조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여기에 적힌 청국장 만드는 법을 보면 “햇콩 한말을 가려서 삶은 뒤 가마니 등에 쟁이고, 온돌에서 3일간 띄워 실(絲)이 생기면 따로 콩 다섯되를 볶아 껍질을 벗겨 가루 내고 이를 소금물에 섞어 절구에 찧는데, 때때로 맛을 보며 소금을 가감한다. 너무 짜면 다시 꺼내어 오이·동아·무 등을 사이사이에 넣고 주둥이를 봉해 독을 묻어 7일이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 옛 청국장 제조법을 복원하면 어떤 맛이 나올는지….
학민사 대표·음식칼럼니스트 hakmin8@hanmail.net
그러나 어머니가 만든 청국장도 <증보산림경제>의 제조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여기에 적힌 청국장 만드는 법을 보면 “햇콩 한말을 가려서 삶은 뒤 가마니 등에 쟁이고, 온돌에서 3일간 띄워 실(絲)이 생기면 따로 콩 다섯되를 볶아 껍질을 벗겨 가루 내고 이를 소금물에 섞어 절구에 찧는데, 때때로 맛을 보며 소금을 가감한다. 너무 짜면 다시 꺼내어 오이·동아·무 등을 사이사이에 넣고 주둥이를 봉해 독을 묻어 7일이 지나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 옛 청국장 제조법을 복원하면 어떤 맛이 나올는지….
학민사 대표·음식칼럼니스트 hakmin8@hanmail.net

사진/ 시골청국장은 100% 홍천산 콩으로 전통의 맛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