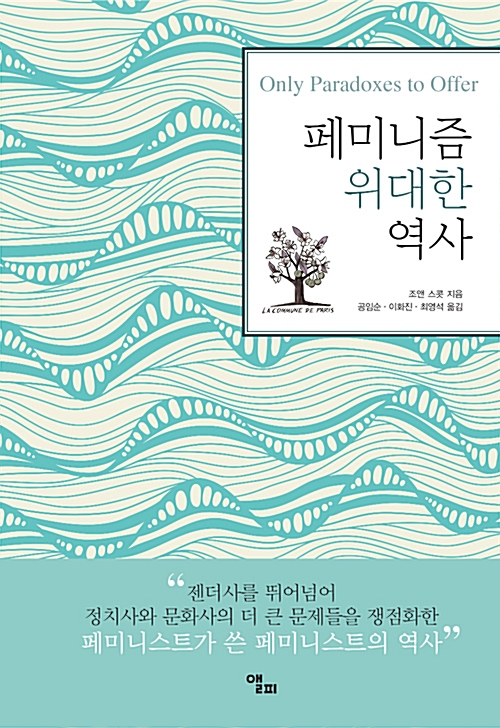
왜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했는지 묻자 스콧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시민권, 개인의 권리, 사회적 의무 등 시민이 되기 위해 성차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거부해야 한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성이 시민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근거는 잔 드로앵의 경우처럼 모성애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남성 못지않은 이성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즉, 성차로 인한 차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성차는 계속 담론 중심에서 논의돼야 했다. 스콧은 이것이 페미니즘이 부딪히는 근본적 역설이라고 주장한다.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는 스콧이 역사학 방법론으로서 젠더를 제시한 이래 생겼던 논쟁에 대한 대답이었다. 스콧은 젠더를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된 차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역사적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차이라고 규정한다. 그가 제안하는 페미니스트 역사 쓰기는 역사적으로 비가시화된 여성들을 복원하고 여성 인물이나 여성 문화에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성이 특정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관념과 지식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성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 언어, 개념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다. 생물학적 여성성과 젠더 사이의 등호를 제거했을 때, 여성사는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냐는 논란이다. ‘여성’ 없이 어떻게 여성사를 이야기하냐는 비판에 대해 스콧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라는 구분은 생물학적 성을 자연화하고, 생물학적 성 역시 사회적 성과 마찬가지로 지식체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고 응수한다. 억압된 여성의 역사를 가시화한다는 일차적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여성성을 긍정하는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연합하는 장소” “정체성이 일시적인 안정성에 의해 획득되는 장소” “정치와 역사가 만들어지는 장소”로서 젠더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잔 드로앵이 모성성을 강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참정권자가 차이를 강조하며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제목이 바뀐 또 하나의 역설 스콧의 문제의식은 내가 여성문학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맞닿았다. 여성이 쓴 글이 모두 여성문학에서 일종의 전범으로서 가치 있다면, 여성문학이 여성이 쓴 글에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한다면, 여성문학사는 남성을 보편 주체로 상상한 문학사의 부록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남성 중심 보편사에 여성의 역사를 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남성들의 문학사를 해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젠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학사에 ‘남성성’이라는 젠더를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보편은 사라지고 성별화된 문학사가 남을 것이며 여성문학을 ‘일부’로 취급하는 경향에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문학사가 아니라 문화사, 젠더사, 사회사 등과 교차하는 복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가 처음 번역됐을 때 원제를 살려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로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책 제목은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스콧이라면 페미니즘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을 텐데 말이다. 특정한 순간을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 또한 일종의 역설이다. 허윤 문학연구자·부경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