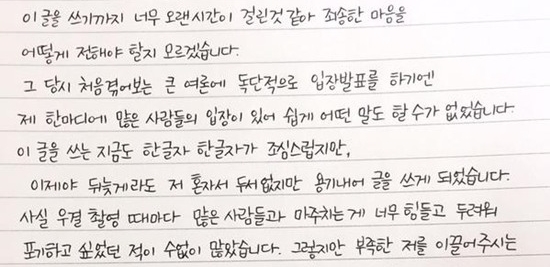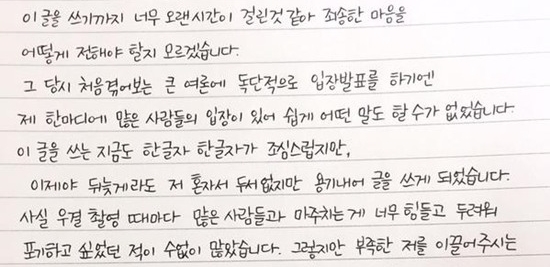한때 연예인의 사과편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SNS 화면 갈무리
나는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다. 특히 호혜평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에서는 더 그렇다. 동료, 이웃, 친구, 피붙이… 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거의 다 해당하네. 그중 언행에 유독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상사 아닐까. 잘못을 들킨 상사의 태도를 분류해본 적이 있다.
A급 멋진 상사: 깔끔하게 사과한다. 와, 리더십까지 있어 보인다. B급 봐줄 만한 상사: 사과는 하지 않아도 잘 해준다. 찔린다는 얘기다. 인간미 있다. C급 소나 닭 같은 상사: 평소대로 행동한다. 그래, 서로 중요하게 안 여기면 된다. D급 후진 상사: 오히려 트집 잡고 미워한다. 옹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터에는 왜 유독 D급이 많은지. 친구는 이를 두고 ‘일터의 법칙’이라 했다.) 대망의 F급 낙제 상사도 있다. 뭘 잘못했는지 아예 모르고 있다. 직원들을 가장 맥 빠지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다.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정글 같은 일터에서 ‘약점’ 잡힐까봐 ‘전략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래갈 처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에서는 어떨까. 아이에게 사과하면 부모의 권위가 침해될까. 양육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이도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나아가 사과받는 법도 모른다. 어지간한 언행은 밖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1차 관계에서 터득하는 게 좋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자존감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과는 조건 없이, 뒤끝 없이, 그리고 정확히 하는 것이다.
그는 아들과 몇 달째 기싸움 중이라고 한다. 학교 근처에 살며 주말마다 다니러 오던 아들이 발길을 끊은 지 꽤 된단다. 메시지조차 ‘읽고 씹히는’ 나날이 이어지는 중이라는데. 실제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말은 “왜 연락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따지고 나무라는 식으로 나오니…. 집안 사정과 서로의 성격과 하필 우연한 일들이 엉킨 마당에 후려칠 듯 소리친 게 내내 걸린다고 했다. 알면서 왜 사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무겁고, 어렵다.
아이가 아침상 차리는 내게 “빨리, 빨리” 재촉했다. 그날따라 서둘러 가고 싶었나보다. 내 양육의 주기도문, “그렇구나~” 넘어가면 될걸, 굳이 하고 말았다. “아침밥 맡겨놨니?” 본전도 못 건질 2절, 3절이 이어졌다. “여기가 패스트푸드점이냐. 맥도날드에서도 그렇게 볶아대면 ‘갑질’이야.” “앞으로 네가 차려 먹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 등교했다. 애를 잡아도 수습할 시간이 있을 때 잡아야 하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오후 학교 마친 아이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어떻게 하면 화 풀 거야?” 바로 답장했다. “엄마가 더 미안해. 우헝헝헝.”
아이에게 나는 사과를 잘 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게 많으니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양육자로서 내가 제일로 꼽는 장점이다. 영향력과 책임, 기타 등등 역학관계를 보았을 때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상사, 아니 엄마라고 여기고 싶다. 내 인생 첫 상사가 떠오른다. 존경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도편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굳이 첫 상사라고 꼽고 싶은 분이다. 그는 잘못했을 때 대처법이 특A급이었다. 바로 사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더 잘못한 게 없는지 물었다. 있는 허물도 덮어주고 나아가 어지간한 기미, 잡티는 ‘뽀샵’까지 해주고 싶은 분이었다. 그는 역시 사람 복이 많았고 하는 일도 잘됐다. 새삼 느낀다. 사과도 실력이다.
애를 혼낸 날 오후, 졸졸 따라다니며 물었다. 오늘 아침 일 말고 엄마가 요새 뭐 더 잘못한 게 없는지. 아이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라며 밀어냈지만, 콧구멍이 벌름벌름한 걸 보니 기분 좋아 보였다. 그제야 내 마음도 놓였다.
김소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