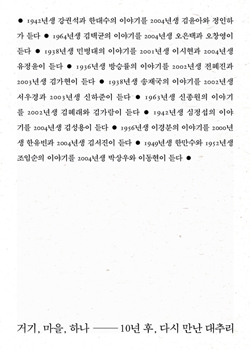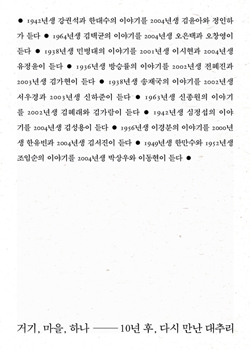‘대추리’ 이름은 갖게 해준다더니…
대추리 행정대집행 10년 뒤의 기록 <거기, 마을, 하나>
등록 : 2019-02-22 14:21 수정 : 2019-02-27 11:48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선명한 것들이 있다. 2006년 5월4일 새벽,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공사를 위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군인들은 헬리콥터로 철조망을 가져와 공사 예정 구간에 설치하고 경찰은 무장한 채 이들을 호위했다. 군경이 아이들 등교 버스까지 막아서자 주민들은 분노했다. 공권력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모습이 뉴스를 타고 생중계됐다. 이날 새벽 펼쳐진 군경의 작전명은 ‘여명의 황새울’. 저녁이면 노을로 붉게 물들던 황새울 들판의 이름을 딴 작전이었다.
2007년 2월, 정부와 이주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추리에 남았던 마흔네 가구 주민들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로 이주했다. 대추리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거기, 마을, 하나-10년 후, 다시 만난 대추리>(평택평화센터 기획, 다돌책방 펴냄)는 이주 10년을 맞은 2017년 주민들의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 중 하나다. 평택평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묻고 주민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매번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옛날과 그때와 오늘의 대추리’에 대한 기록을 구술로 담았다.
따지고 보면 대추리 사람들은 늘 쫓겨나기만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가 세워지며 ‘원대추리’에서 쫓겨났고, 해방 뒤 미군이 기지를 확장하면서 ‘구대추리’로 다시 밀려났다. 2002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 쫓겨나 현 대추리 평화마을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여태 끝나지 않았다.
2007년 합의안에는 노와리 이주단지의 명칭을 ‘대추리’로 바꿀 수 있고, 주민들 생계를 위해 상업용지 8평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추리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았던 방승률(83)씨는 “우리가 나올 때 정부와 협상 볼 적에 대추리라는 명칭은 꼭 갖게 해준다고 했었던 거, 그게 안 되는 거가 제일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식으로 지은 집 한 채만 가졌을 뿐 돈벌이도 막막하다. 스물네 살 때 시집와 대추리에서 살았던 한대수(77)씨는 말한다. “돈벌이가 없지, 아무것도. 대추리에서 살았으면 내 손으로 농사짓고 애들 도와줘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주해 10년을 살았어도 정이 붙지 않는지 송재국(81)씨는 옛날 집이 그립다. “대추리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그렇게 살 때는 들어가면 온화하고 포근했는데…. ”
대추리 주민들이 국가의 이주계획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건 보상비가 적어서도, 전문 데모꾼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아니었다. “올해도 농사짓자”던 시위 구호 그대로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제주 해군기지 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 바람은 모두 같았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주민 김택균(55)씨는 정부에 이 말이 하고 싶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새겨들을 이야기다.
김미영 <한겨레>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