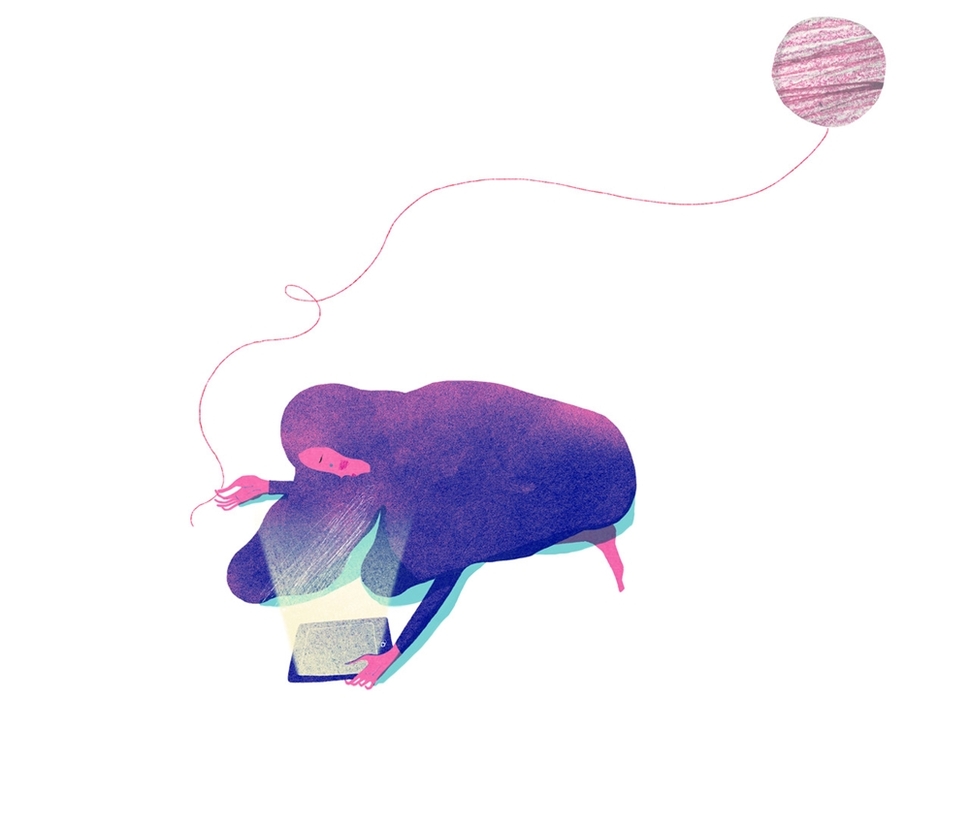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엄청 어려운 스테이지를 깨고 온 느낌? 그래서 자기가 만든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감정이입이 연다.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 감정이입은 다른 이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것을 본인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해 해석함으로써 조금이나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일이다. 당사자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몸이나 가슴, 혹은 머리에 새기고, 마침내 그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반응한다. 동일시라는 말은 나를 확장해 당신과 연대한다는 의미이며 당신이 누구와 혹은 무엇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들린다고 다 말인가. 공짜가 없다. 자기 목소리를 죽여야 남의 말이 들린다. 소리가 말이 되려면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리베카 솔닛은 독재정권에 맞선 버마 승려들과 연대하며 수천㎞ 떨어져서도, 그 붉은 승복이 붉은 실로, 자기에게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같은 책에 블루스 음악가 찰리 머슬화이트의 금주 사연이 나온다. 알코올중독자였던 그는 1987년 한 라디오 방송을 듣다 술을 끊었다.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우물에 빠진 날이다. 그 구조 작전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머슬화이트는 “왜 나는 이 아이 반만큼도 용기가 없는 걸까. 아이가 구출될 때까지는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겠어”라고 다짐했다.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아이뿐만 아니라 머슬화이트도 구조됐다. 허5파6의 웹툰 <여중생A> 속 주인공 미래는 16살 왕따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면 옷장에 숨는다. 어쩌다 걸리면 맞는다. 학교 소풍 전날엔 비 오기를 빈다. 이 웹툰은 미래가 자신의 고통을 재료 삼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 같은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라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깨고 나오는 이야기다. “나 지금 엄청 어려운 스테이지를 깨고 온 느낌이야.” 미래는 어느 날, 반 친구 유진에게 한 이벤트에 낼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덜덜 떨며 말했다. 그렇게 친구가 돼 유진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다. “보잘것없는 경계심으로 운명을 짚어보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인간 능력 밖의 오만한 가늠이었는지 모른다. 자기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처음부터 진실하게 다가갔다면 우리 사이가 어땠을까. 오히려 애들한테 선을 긋고 계급을 나눈 건 나였던 거야.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들.” 마흔이 넘은 나는 16살 미래만큼 용감한 적이 없었다. 아직도 덜 배가 고픈 걸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게 왜 이리 어려울까. 노력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내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실패더미들로 ‘나는 왕따잖아’라는 이야기에 물을 대주거나, ‘나는 나가려고 하잖아’라고 부추기거나. 리베카 솔닛은 이렇게 썼다. “가끔은 나쁜 소식이 우리를 진실한 삶의 길로 이끌어주기도 한다. 난폭하게만 보였던 손님에게 나중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라고나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꼭 변해야 할 때가 아니면 변하지 않게 마련이고, 위기가 변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아직도 배가 덜 고픈 걸까? 좀비로 제 살을 뜯어먹으며 살래? 컴퓨터를 켜는 거 보니, 더 불행해야 바뀔 모양이다. 김소민 자유기고가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