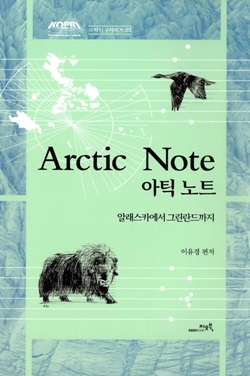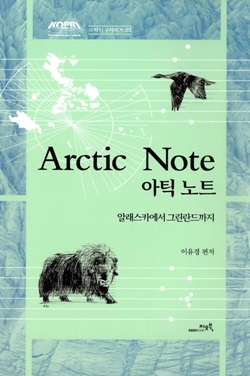알뜰살뜰한 북극 길라잡이
극지연구소 과학자들의 좌충우돌 기록 <아틱 노트>
등록 : 2018-02-03 00:02 수정 : 2018-02-04 11:02
제사(題詞) 자체가 책의 ‘압권’인 때가 있다. 제사는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 따위를 적은 글’이다. <아틱 노트>(지오북 펴냄)의 제사가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때때로 고독과 사색이 필요하다. 깨달음은 분주한 문명의 중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외로운 장소에서만 찾아온다.” 노르웨이 탐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프리드쇼프 난센(1861~1930)의 말이다. 난센은 1893년 자신이 만든 탐험선을 타고 북극해 횡단을 시도했다. 2년 뒤 그는 북위 86도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당시로서는 인류가 밟은 최북단이었다. 이후 그는 국제연맹(국제연합의 전신)에서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일하며 난민을 위한 최초의 여권(난센 여권)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일로 난센은 192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책을 엮은 극지연구소 연구원 25명은 ‘한국의 난센들’이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호기심” 하나만 믿고 북극에서 좌충우돌해왔다. “툰드라 토양 코어를 얻으려다가 땅속에 코어가 박혀 얼어붙는 바람에 다시 빼내려고 삽질하며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모기 떼의 환영을 받아 손과 얼굴이 퉁퉁 붓기도 했습니다. 북극해 얼음 위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얼음이 보이질 않아 처음 계획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북극곰을 만나고, 밤하늘 오로라의 향연을 보고, 새벽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며 북극해 탐사를 한다.
책에는 ‘북극은 어디인가?’부터 ‘북극이사회, 북극의 협력마당’까지 22편의 글이 실렸다. 기후 관측과 토양·화석 연구 등에 나선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겼다. 일반 독자를 위해 쉽게 쓰고 사진·도표 등도 많이 실었다. “북극에 관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책 중 가장 우수한 책”이라는 평은 빈말이 아니다.
좌충우돌 몇 장면. 2000년대 후반 정지웅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빙하 시추 기술자’로 일컬었다. 지금도 많지 않거니와, 열악했던 당시 현실을 보여준다. 2009년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빙하 시추 캠프에서 시추기를 조작하고 있었다. 작업은 무난했고 시추기 모터를 끄고 잡아당기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모터를 끄는 것을 잊고 시추기를 잡아당겨버렸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때 옆에 있던 작업자들이 말했다. “지웅아 걱정 마, 이건 그냥 얼음덩어리일 뿐이야. 잘못되면 우리가 해결하면 돼.” 7월 중순 한여름,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탐사에 나섰던 남성진 연구원. 얼어붙은 땅을 파는데 해만 나면 모기 떼가 웽웽 달려드는 게 아닌가. 한여름엔 ‘봄 날씨’라는 현지인의 말만 믿었다가 추위에 놀라 방한용품을 서둘러 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북극발 한파’라는 뉴스로만 북극을 떠올릴 때, 북극은 외로울 것이다. 알아야 보이고, 들어야 열리며, 닿아야 느낀다. 이런 점에서 <아틱 노트>는 북극에 대한 ‘격물치지’의 기록이다.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앎에 이른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는 꿈이며 도전이 되기를….” 지은이들의 소망이다. 한국은 2013년 5월15일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가 되었다.
전진식 <한겨레> 교열팀장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