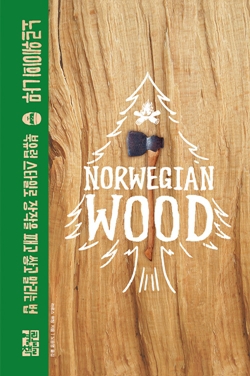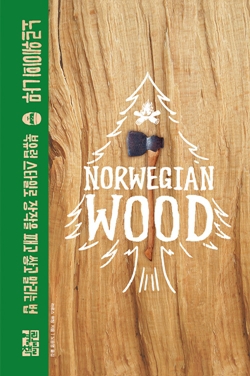꽃보다 장작
노르웨이 사람들의 유별난 나무 사랑 <노르웨이의 나무>
등록 : 2017-11-23 22:50 수정 : 2017-11-27 15:36
북유럽 사람들에게 나무는 특별하다. 그들은 거대한 물푸레나무 위그드라실의 가지가 세상을 감싸고 여기에서 최초의 인간이 생겨났다는 창조 신화를 갖고 있다. 영하 20℃는 예사로운 이들에게 나무는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생존의 보루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한 시인은 “갓 벤 나무의 냄새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잊을 수 없지. 수액이 흐르는 봄에 갓 벤 흰 나무의 냄새는 생명 자체”라며 나무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의 한 가지”라고 찬미했다.
노르웨이 사람들의 나무 사랑을 생활로 치환하는 작업은 땔나무 장만이다. “나무가 없었다면 북유럽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노르웨이의 나무> 작가이자 노르웨이 언론인 출신인 라르스 뮈팅은 벌목 방법, 연장의 종류와 사용법, 건조 과정, 장작 쌓기의 갖가지 유형, 난로의 역사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영국 신사가 탄광을 소유하는 것의 이점은 벽난로에 장작불을 땔 수 있는 품위를 누린다는 것”이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때는 19세기 말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선 21세기에도 장작이 일상이다. 산유국임에도 이 나라의 개인 주택 난방용 에너지는 25%가 나무이고, 이 중 절반은 보통 사람들이 팬 장작에서 생산된다. 길이 60cm 장작을 기준으로 할 때 노르웨이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땔감을 높이 1m로 쌓으면 무려 7200km에 이른다. 이는 수도 오슬로에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처럼 땔나무 소비가 급증한 데는, 석유·전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대안에너지의 중요성을 자각한데다 정부가 나서서 열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청정 연소 난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 것도 한몫했다. 난로 제조회사들은 아름답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으며 장작불의 욕구를 자극했다.
<노르웨이의 나무>가 소개하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장작 사랑은 유별나다. 벌목하는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연합은 노르웨이 나무표준위원회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맞춰야 하고, 노르웨이나무기술연구소 산하 ‘건조클럽’이라는 자문기구는 이상적인 장작의 건조 상태를 표준화한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술집에 모여 어떤 체인톱이 더 우수한지 입씨름을 벌인다. 장작 쌓기는 실용 차원을 넘어 ‘아트’ 수준까지 이른다. 지방신문들은 해마다 최고의 장작더미를 뽑는 대회를 여는데, 수상자들은 장작더미로 작곡가 로시니의 얼굴을 표현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한다. 2011년 출간된 이 책은 노르웨이·스웨덴에서 30만 부 넘게 팔렸다. 2013년 노르웨이의 한 공영방송은 금요일 밤 황금시간대에 벽난로에 장작 타는 모습을 12시간 연속 방영했는데, 시청률이 20%를 넘겼다고 한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외딴 시골집이나 근사한 전원주택에서나 땔감을 쓰는 한국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선 체인톱, 도끼, 통나무 집게 같은 벌목 용구가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차디찬 무릎으로 길에서 돌아오면 따뜻함을 바라노라”(13세기 옛 북유럽의 서사시)라는 글귀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 또 한 번 겨울을 맞으며 얼어붙는 마음 한구석에 온기가 감도는 것이다.
이주현 <한겨레> 문화부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