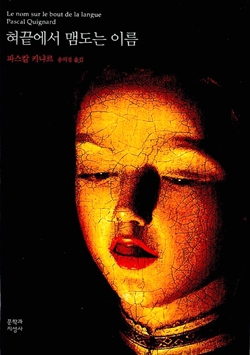
콜브륀은 맞은편에 사는 죈느라는 청년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콜브륀은 혼잣말을 이어나가며 짝사랑의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죈느, 곰의 옛말, 콜브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고 읊조리는 그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였다.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듯,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듯,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응당 그래야만 하는 존재나 진배없었다. 사랑에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오로지 죈느라는 이름뿐이었다. 죈느의 아내가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바치겠노라, 그녀의 기도를 듣고 찾아온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길 잃은 영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콜브륀이 죈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드비크 드 엘, 영주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거였다. 만약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1년 뒤 영주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위험한 내기였다. 콜브륀은 자신을 통째로 걸었으나 자신만만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 9개월이 지난 뒤, 콜브륀이 영주의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름은 생각날 듯 말 듯 그녀의 입술을 맴돌았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허사였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행복했으므로 두려움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집안일에는 아예 손을 떼어버린 채, 가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삐쩍 마른 몸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다. 다행히 죈느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알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이 번성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아마 그녀는 평생 죽음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다. 죽음은 언제라도 다시 찾아와 잠든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물을지 몰랐다. “내 이름을 기억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겠는가. 이름을 잊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끌려갈 것임을 너무 잘 아는 그녀였다. 우리의 동화, 우리의 해피엔딩 그런 그녀가 첫아이를 낳았을 땐 어땠을까. 여느 사람들처럼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해하며 가슴 먹먹해지는 순간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자식을 지켜줄 이름을 찾느라 전전긍긍했을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낯익다. 테이블 한 개, 초 한 자루, 실타래, 물레 하나, 콜브륀 부부의 유산 목록이다. 하나를 더하자면,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오래도록 남았다. 죽음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름을 남겼듯, 그녀 또한 자기 이름을 남겨두었다. 콜브륀, 삶의 다른 이름, 초 한 자루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전설이자 동화, 우리의 해피엔딩. 황현진 소설가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