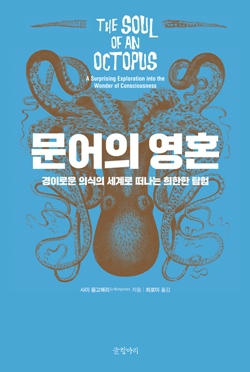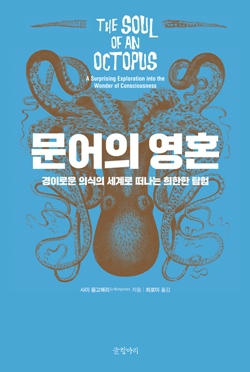“문어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동물학자 사이 몽고메리의 과학에세이 <문어의 영혼>
등록 : 2017-06-21 18:12 수정 : 2017-06-24 12:21
“조지는 착했어요.” “트루먼은 기회주의자였죠.” “기네비어는 충동적이에요.”
조지·트루먼·기네비어가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다. 이들은 두족류(Cephalopods)의 대표적 생물인 문어다. 보송한 털 대신 끈끈한 점액으로 뒤덮여 있고, 척추가 없는데다 푸른색 피, 세 개의 심장을 가졌다. 그 특이한 생김새로 인해 문어는 외계생물의 원형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렇다. 인간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그 문어 말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출신인 옥타비아는 좀체 곁을 내주는 ‘성격’이 아니다. 처음 만났을 땐 접촉하자마자 놀라 도망가더니, 두 번째 만남에선 먹이인 오징어를 팔이 얼어붙도록 물속에서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았다. 세 번째엔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 4개의 팔에 달린 빨판으로 사람의 양팔을 흡착해 수조로 잡아당겼고, 네 번째 가서야 눈을 마주하며 팔을 만지작거렸다. 사육사 빌은 옥타비아를 향해 “쌀쌀맞다”고 했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는 문어는 어떤 의미에선 “인간 그 이상의 존재”다. 이들은 수조에 띄운 병에 물을 쏘며 ‘논다’. 좋아하는 장난감도 다르다. 친숙한 사람에겐 개처럼 배를 뒤집고, 싫은 사람에겐 물을 튕긴다.
동물학자이자 작가인 사이 몽고메리가 문어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어의 영혼>(최로미 옮김, 글항아리 펴냄)은 몽고메리가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에서 만난 문어 아테나·옥타비아·칼리·카르마의 삶과 죽음·욕망을 다룬 과학에세이다. 책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사고와 언어로 문어의 세계를 해석한다. 따라서 “다정하다” “충동적이다” 같은 몽고메리의 해석이 100%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묘사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문어를 하등한 것으로 낮잡아보는 인간의 오만함을 은근히 꼬집기 때문이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그의 작품 <바다의 노동자>에서 문어를 인간의 피를 빠는 ‘악마의 물고기’로 그렸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은 ‘괴물’로 묘사한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어는 ‘끔찍함’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몽고메리는 이 간극을 메우려 애쓴다. 책에서 문어는 동물 전체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문어는 인간들의 편견과 달리 ‘성격’ ‘지능’ ‘감정’을 가졌다. 저자는 문어의 이런 모습을 묘사하며 인간이 다른 종에게 갖는 비이성적인 공포와 편견을 뛰어넘을 계기를 만든다.
오래 산 문어가 그렇듯, 3살이 넘은 옥타비아도 결국 “노망”이 났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거나, 먹이를 공격하지도 않고” 창백하게 늙어갔다. 부화되지도 않을 알을 품고, 천적 해바라기불가사리의 접근에 싸우러 나간다. 죽음을 앞둔 순간의 모성.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데카르트 명제는 이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문어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장수경 <한겨레> 편집3팀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