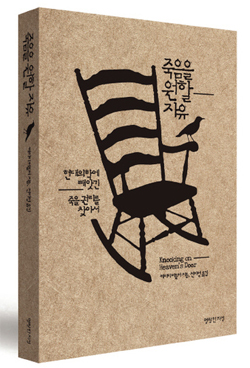현대의학에 빼앗긴 ‘죽을 권리’를 찾아라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부른 폐해를 고발한, 케이티 버틀러의 <죽음을 원할 자유>
등록 : 2014-08-21 16:50 수정 : 2014-08-22 17:44
현대 의학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저널리스트 케이티 버틀러는 〈죽음을 원할 자유〉에 아버지의 투병생활을 통해 현대 의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고발한다. 버틀러(가운데)와 부모님의 모습. 명랑한지성 제공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는 병원 진료를 받다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 진단을 받는다. 의사는 즉각 심박조율기 시술을 결정했고, 의학 지식이 전혀 없던 가족들은 의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후 가족들의 삶은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 지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아버지는 치매까지 앓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도 없는 텅 빈 삶을 살아간다. 그를 간병해야 하는 고령의 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지쳐간다. 죽음이 축복이 되고 삶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첨단 의학보조장치 심박조율기는 계속 뛴다. 남은 생에 대한 선택권 없이,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죽음을 향해 간다.
무엇이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나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케이티 버틀러가 7년 동안 아버지의 투병을 곁에서 지키며 겪은 일을 담은 <죽음을 원할 자유>(명랑한지성 펴냄) 속 이야기다. 과도한 연명치료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죽을 권리를 빼앗은 최첨단 의학기술이 삶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연장하며 수많은 갈등과 폐해를 낳는지를 파헤친다.
이 책은 가족의 회고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픈 경험을 현대 의료 문제에 대한 고발로 시야를 확장한다. 부제 ‘현대 의학에 빼앗긴 죽을 권리를 찾아서’에서 드러나듯, 책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받는 현대 의학이 오히려 인간을 질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 죽을 자유조차 빼앗은 현대 의학의 차가운 손에서 죽을 권리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의료계와 관련 산업 사이의 밀월을 폭로하면서, 현대 의료체제가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치유에 집중하지 않고 경제적 수익에 몰두한다고 고발한다. 그는 “금융적 제약이 치료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의사들은 모욕감”을 느끼겠지만, “주택모기지 공제가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것처럼 경제적 인센티브와 그 반대되는 요인들 즉 죽음을 지켜보는 불편함, 전문가로서 실패했다”는 의료진들의 감정이 환자의 나이와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심박조율기를 시술하고,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공급하는 과잉진료를 한다고 진단한다. 과잉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뒤따른다. “과잉치료로 인해 미국 의료체계가 지는 부담은 한 해에 1580억~2260억달러로 추정된다. 노인들의 4분의 1은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 간병비 및 의료비에 쪼들린 나머지 살던 집을 포함해 저축을 모두 써버린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을 파헤친 날선 비판 속에는 아픈 아버지의 보호자로서 저자가 겪은 고통, 죽음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선 가련한 인간의 갈등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골 깊은 가족 간 갈등과 그 지난한 화해의 과정 또한 가슴 뭉클하다.
‘빠른 의학’에서 ‘느린 의학’으로
저자는 “가족들을 대면한 일 없는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무익한 치료를 행하기에 바쁜” ‘빠른 의학’에서 벗어나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느린 의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그가 건네는 처방전은 또 있다. “죽음이 면전에 닥칠 때까지 죽음과 얽히는 것을 꺼리는 우리 문화 내부”를 바꾸라는 것이다. 예전 우리 선조가 그랬듯, 죽음을 다시 성스럽고 친숙한 것으로 만드는 길을 발견해야 자신의 죽음에 직면할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고. “죽음이 닥치기 훨씬 이전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공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죽음을 영원히 미룰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목소리에 계속 넘어갈 것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