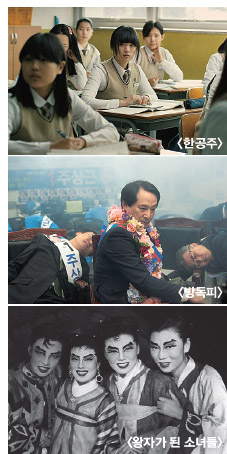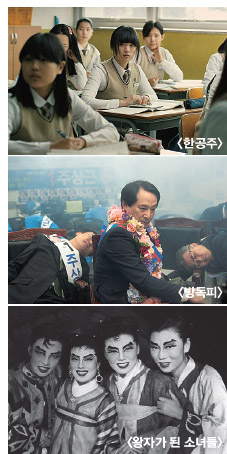사회 갈등 돌아보고 배우 연기에 취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작은 영화들
등록 : 2014-04-13 13:59 수정 :
보고 싶은 영화를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하필 그 영화가 빵빵한 배급사를 끼고 있지 못하거나,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작은 영화였다면 어영부영하다 놓치기 십상이다. 영화계 안팎에서 활동하는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 영화평론가, 김지현 시나리오작가가 극장에서 일찍 사라져 아쉬웠거나 작지만 힘을 내주길 바라는 영화 여러 편을 추천했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 영화를 추천하기에 앞서 관객의 입소문보다 마케팅의 힘에 기대는 영화 배급과 상영 시스템을 지적하고 싶다. 장기 상영 시스템을 통해 관객에게 좋은 평을 얻은 영화가 자연스레 상영관을 확장해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 안에 있다. 이른바 예술영화 극장을 찾는 관객도 외국 영화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보니 한국의 작은 영화는 더 소외받는 듯하다. 그중에 한 작품을 추천하자면 개봉 예정작인 <한공주>.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한 영화다. 국내외 영화제에서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 영화도 잘 만들어져서 벌써 화제가 되고 있는데, 흥행은 어떨지 궁금하다.
황진미 영화평론가 - <밍크코트> <짐승의 끝> <방독피> 세 편의 한국 영화를 추천한다. <밍크코트>는 어머니의 존엄사를 둘러싸고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 계급 차이, 종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이 극대화된다. 가장 가난했던 딸이 어머니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다른 형제들에 맞서 반대하는데, 이 형제들은 중산층에 이른바 보수 기독교를 믿는 이들. 가족에 맞선 여성은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 이단이다. 관객에게도 이 여성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여성이 나중에는 일종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과정은 좀 미묘하더라도 신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족 화해라는 가장 보편적인 윤리를 말한다. 이단이냐 정통이냐는 사회적 기준부터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갈등을 돌이켜보게 되는 영화다. <짐승의 끝> 또한 종교성이 짙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만약 흥행했다면 논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종말론을 다룬 영화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스럽고 거룩하지 않은 인물로 등장한다. 그렇다고 악마적이지도 않다. 야비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다. 송중기 주연의 흥행작 <늑대소년>을 연출한 조성희 감독 작품이다. 순수와 그로테스크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면, <짐승의 끝>은 <늑대소년>의 동화적 순수의 뒷면을 보여주는 영화다. 김곡·김선 감독의 <방독피>는 일단 웃기고 재미있다. 처음에는 시시껄렁한 정치 풍자로 시작해 점점 여러 겹의 플롯을 만들어가며 한국 사회의 불안, 사람들의 무의식적 분열을 그린다. 각자의 에피소드가 교차편집 되면서 클라이맥스에서 이야기가 폭발하는데, 격동하는 불안과 분열을 보여준다.
김지현 시나리오 작가 - 대작은 감독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영화는 <씨, 베토벤>이 그렇듯 배우가 기준이 되는 듯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인데, 그 사람 연기가 죽인대” 이런 추천을 듣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몇 작품을 추천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개봉한 <언 애듀케이션>은 영국의 잘 알려진 소설가인 닉 혼비가 시나리오를 썼다. 여주인공인 캐리 멀리건도 매력 있게 나오는데, 극장에서 일찍 간판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예영화나 성장영화가 흥행하기 힘든 모양이다.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하고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연출한 <프라미스드 랜드>는 협상 전문가의 고군분투를 그린 흥미진진한 얘기다. 이 작품도 입소문을 타기 전에 극장에서 사라졌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최고 엔터테이너로 한 시대를 풍미한 리버라치의 생을 그린 <쇼를 사랑한 남자>는 들어보셨나? 마이클 더글러스, 맷 데이먼 등 국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 출연해 좋은 연기를 보였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다. 한국 여성국극 세계를 그린 다큐멘터리영화 <왕자가 된 소녀들>도 극장에서 빨리 내리는 바람에 놓쳤다. 관객 입장에서,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해 만나보기 힘든 작은 영화들이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