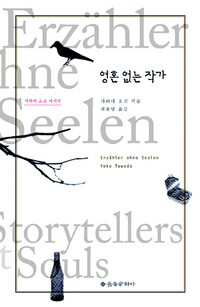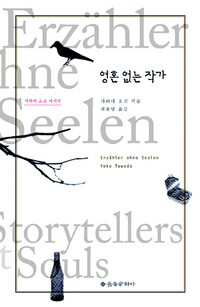언어 이주민이 속삭인 자유의 순간
독일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글을 쓰는 다와다 요코의 <영혼 없는 작가>…
언어의 구속과 해방에 대한 깊고 유연한 성찰
등록 : 2011-09-27 15:17 수정 : 2022-12-14 15:54
저는 당신의 약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 1960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여 와세다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다. 열아홉 살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홀로 독일로 갔다.” 그 뒤 당신은 일본어와 독일어를 오가며 글을 쓰셨군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독일어로 쓴 글을 한국어로 읽고 나서 저는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고 단순한 문장이 이토록 깊고 유연한 생각을 운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밀을 당신의 약력에서 찾아보려 했던 것이지요.
저는 언어의 이주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모국어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모국어와의 유착관계가 제게는 아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계’와 ‘횡단’을 이야기하지만 제게 이 주제가 한 번도 절실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책 <영혼 없는 작가>(을유문화사·2011)는 저를 조금 바꿔놓는군요. 저는 모국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갇혀 있는 자의 생각이었군요. 세상에는 해답을 알기 전에는 문제가 뭔지조차 알 수 없는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 막 도착했을 때 당신도 그랬던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독일어] 단어는 내 감정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모국어에도 역시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낯선 외국에서 살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14쪽)
외국어를 배우면 모국어를 상대화할 수 있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레벨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이니까요. 성인이 되어서 낯선 외국어를 배워본 ‘언어의 이주민’만이 ‘언어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 모국어가 내 온몸에 기입해놓은 온갖 생각의 코드를 비로소 의식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나를 먼저 타자화하지 않으면 타자와의 소통이 힘들다는 것. 당신이 ‘유창한 모국어’에 느낀 구역질이란 ‘자기가 편협함인지를 모르는 편협함’에 대한 구역질이겠지요. 세상에는 문제가 뭔지조차 몰라서 이미 오답을 말해버린 게 되는 경우도 있군요.
“영혼은 비행기처럼 빨리 날 수 없다는 것을 인디언에 관해 쓴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없는 채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심지어는 시베리아 열차도 영혼이 나는 것보다 빨리 간다. 나는 처음 유럽에 올 때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 (중략) 그다음에 나는 몇 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했는데 도무지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여행자들은 왜 모두 영혼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26∼27쪽)
그래서 당신은 “영혼 없는 작가”입니다. 아니, 작가란 본래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드롤빵’이나 ‘물고기’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고 당신은 적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모국어에 민족의 영혼(얼)이 담겨 있다는 식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요. 중요한 것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자유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떤 얽매임도 없기 때문에 딱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당신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들에게 띄웁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글이 더 많은 독자와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부끄럽게도 이 책을 읽고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된 당신의 첫 책인 것은 아니네요. 서경식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경계에서 춤추다>(창비·2010)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다와다 요코’가 아니라 ‘타와다 요오꼬’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서점에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인 것처럼 등록돼 있네요. 어쩐지 당신은 그편이 더 재미있다며 좋아하실 것만 같군요.
신형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