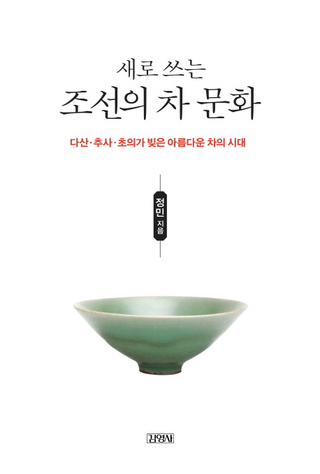
정민 교수의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다산 정약용은 조선 차를 중흥시킨 주역이었다. 유배지 강진에서 신병을 치료하려고 차를 마셨던 그는 다산초당에 정착하면서부터 차를 직접 만들었다. 다산이 이용한 차는 만덕산 백련사 주변의 야생차였는데, 채식 위주의 한국인에게 맞도록 야생차의 독성을 눅이는 제조법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다산이 만든 차는 오늘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잎차가 아니라 떡차란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다산학의 산실로 알려져왔던 전남 강진군 다산초당이 이제부터 우리의 차 문화를 중흥시킨 산실로 조명받게 되었다. 초의 의순은 다산차의 제조법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차박사다. 초의는 다산이 강진을 떠난 이후 본격적으로 차를 만들었고, 정조의 사위인 홍현주의 부탁으로 시 형식을 빌린 차 이론서인 <동다송>(東茶頌)을 지었다. 초의는 이 글에서 차의 역사와 우리 차의 효용, 차 마시는 절차와 방법까지 정리했다. 그는 다양한 모양의 떡차를 만들고 대껍질로 단단히 포장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초의 차를 전국으로 알린 사람은 추사 김정희다. 그는 북경에서 완원(阮元)이 끓여준 차의 맛을 잊지 못하다가 초의 차를 만나면서 조선 차에 매료됐다. 추사는 초의에게 차를 보내라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유배길에 초의 선사가 머물던 대흥사 일지암을 방문한 이후 제주도에서 차를 배달받았다. 추사는 보답으로 글씨를 보냈는데, 일로향실(一爐香室), 죽로지실(竹爐之室), 명선(茗禪) 같은 명품 글씨들은 초의 차를 인연으로 하여 남게 되었다. 차로 유명해진 초의는 서울을 출입하며 당대의 명사인 정약용·김정희·신위의 집을 방문했고, 홍현주·신헌·허련을 만났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1830년 겨울 한강변의 수종사에서 열렸던 모임이다. 모임의 주인공은 초의와 정약용의 두 아들이고, 발문은 정약용·홍현주·이만용이 썼으며, 모임에 관한 기록은 신헌의 문집에 수록됐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명사들의 만남이 초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술보다 차를 좋아했다는 홍현주는 친형 홍석주를 정약용과 연결한 인물이고, 김정희의 제자인 신헌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주역이다. 읽는 재미에 사료적 가치까지 이 책에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원형 사진과 이를 탈초한 원문, 번역문이 모두 수록돼 있다. 차 이야기를 읽는 재미와 함께 자료집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뜻이다. 책의 부록에는 조선 후기의 차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연보가 있고, 찾아보기는 서명·작품명·인명·용어를 구분해 정리했다. 독자를 위한 편집자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의 차 문화사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차 문화사로 관심을 넓히겠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차 이야기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김문식 단국대 교수·사학 * 정민 지음, 김영사 펴냄, 3만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