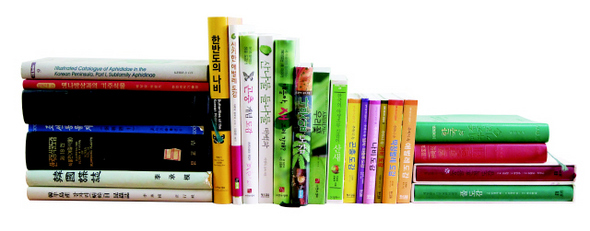
2000년대 들어 마니아층 커지며 소재 다양화·세분화로 생물도감 출간 ‘대폭발’.

지금은 도감 전성기
2000년대 도감의 전성기가 열렸다. 2003년 야생화 바람(이유미의 <한국의 야생화>(현암사), 윤주복의 <야생화 쉽게 찾기>(진선출판))을 시작으로 신구문화사의 포켓도감(2004), 현암사의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시리즈(2005), 진선출판사의 ‘호주머니 속의 자연’(2004) 등이 소재를 다양화하면서 쏟아져나왔다. 어린이용으로 인식되던 도감이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번역이 아닌 한국 토종으로 자리잡아갔다. 이 시장의 포화를 감지한 이후의 주요 경향은 세분화와 동정의 다양화다. <야생화 쉽게 찾기> 등 식물 관련 도감을 12권 낸 윤주복씨는 “(독자가) 맨 처음에 꽃을 좋아하면서 식물의 이름을 알아가다가, 꽃만으로는 이름을 알기 어려운 식물을 접하면서 가지나 눈, 껍질 등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까지 관심을 확대해왔다”고 말한다. 꽃에서 나무로 넓어지고, 나무에서 나뭇잎으로 세분화해온 것이다. 겨울눈과 잎을 기준으로 식물 동정을 하는 <겨울나무 쉽게 찾기>(진선출판, 2007)와 <나뭇잎 도감>(진선출판, 2010)이 나왔고, 동물의 흔적으로 동물을 찾는 <세밀화로 그린 동물 흔적 도감>(보리출판, 2006),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세밀화로 그린 갯벌 도감>(보리출판) 등이 출판됐다. 성숙한 마니아들의 커뮤니티식 협업 이러한 도감 대폭발의 배경으로 조영권 편집장은 “생태안내자, 자연안내자, 숲해설가의 증가”를 든다. 숲해설가는 2002년 4월 산림청에서 도입한 이래 현재 100개 이상의 양성과정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천여 명이 배출됐다. 어느 게 먼저랄 수 없겠지만 전문가급 디지털카메라의 대중적 보급도 이런 경향에 불을 붙였다. 사진을 찍고 이를 ‘동정’할 도감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마니아층이 성숙해지면서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내지 않던 분류군에 집중하는 새로운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노린재 도감>이 그 성과의 하나다. 곤충학자 정부희의 <곤충의 밥상>(다른세상, 2010), 김성호 교수의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웅진지식하우스, 2008), <동고비와 함께한 80일>(지성사, 2010) 등도 ‘미답의 생물 에세이’의 중요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글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