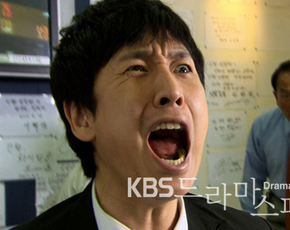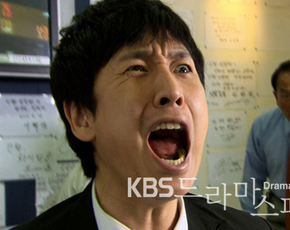‘팬질’이라는 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순간이 있다. 바로 다른 팬을 만나 팬질의 구력을 겨루는 시간. 그러니까 “너 언제부터 우리 오빠 팬이었니?”다. <하얀 거탑>으로 김명민이 본좌의 경지에 오르자, <뜨거운 것이 좋아>(2000)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아버지와 아들>(2001) 팬이었다느니, 오라버니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침 튀기며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였더랬다.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만인의 연인이 된 ‘셰~프’ 이선균의 팬이라면 단연 그의 단막극 시절을 논하며 거품을 물리라. 나중에 미니시리즈가 된 <낭랑 18세>(2003)에서 <반투명>(2004)의 스토커, <연애>(2005)의 찌질한 고시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섬뜩한 사이코)으로 나온 <거미여인의 사랑법>(2005)을 거쳐, 후줄근해서 더 좋았던 연애 후일담 <후>(2006)에 이르기까지, 제목만 들어도 다시 보고 싶은 작품 잔뜩이다. 물론 그 으뜸은 <태릉선수촌>(2005) ‘동경이’겠지만. 이선균뿐이겠는가. <제주도 푸른 밤>(2004)이 없었더라면 엄태웅이 그렇게 슬픈 눈빛을 가졌음을 어떻게 알았으며, <간직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1999)가 아니라면 황인뢰 감독의 영상 속에 소지섭과 전도연을 같이 보는 일이 가능이나 했겠나.
정말 고마운 ‘드라마시티’ ‘베스트극장’. 낮잠 많이 잔 일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텔레비전에 코를 박았고, 그렇게 잘 짜인 단막극을 하나 보고 나면, 처음 현진건 소설을 접한 중학생처럼 서늘한 쾌감을 느꼈다. 거기서 만난 작가 이름을 외워두었다가 후에 미니시리즈나 연속극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면 괜히 뿌듯했다.
이러니, 근 2년 만에 한국방송에서 ‘드라마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단막극을 부활시켰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기대에 부풀었는지는 짐작들 하실 터. 노희경 작가의 <빨강사탕>을 필두로, 토요일 밤 11시를 기다린 지 넉 주가 지났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었지만, <얼렁뚱땅 흥신소>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박연선 작가의 흥신소 2탄 <무서운 놈과 귀신과 나>처럼 짜릿한 녀석들도 있었다.
때로는 경쾌해서 좋고, 어떤 때는 찝찝해서 좋으며, 종종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해서 좋은 단막극의 ‘묻지마’ 팬이지만, 드라마에는 각 체급에 맞는 소재와 줄거리가 있기 마련이어서 1시간에 담으려는 내용이 너무 과하거나 구성에 밀도가 약하면 김이 빠진다. 말하자면 ‘체급’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안 맞으면 바로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이다(한 나라 정부가 일개 시민단체가 국제기구에 낸 의견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처럼).
하여튼, “단막극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는 이선균처럼, 더 많은 ‘단막극의 아이들’이 나와 드라마 스페셜이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똥찬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가지망생들과, 아이돌 그룹 리더 말고도 재능 있는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고, 그래서 광고도 더 많이 붙고, 미니시리즈로 다시 제작되는 작품도 늘고… 그렇게 그렇게, 단막극이여 영원하라, 팍팍!
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