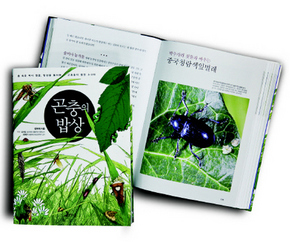
〈곤충의 밥상〉
박주가리 젖물과 싸우는 중국청람색잎벌레를 보려면 며칠 동안 ‘하리꼬미’(불침번)를 해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며칠 동안 벌레가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아침, 드디어 곤충 발견!” 하리꼬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껏 중국청람색잎벌레가 알 낳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맘먹고 박주가리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왕거위벌레가 새끼를 위해 집을 짓는 과정도 꽤나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것인데, 이 재미가 쏠쏠했으리라 싶다. 왕거위벌레가 왔다갔다 하며 잎을 고르고, 잎 주맥의 오른쪽·왼쪽을 재단하고, 주맥을 씹어 상처를 내고, 바닥 부분을 정확히 가공하면서 아래쪽 잎사귀 끝부분부터 말아올린다. 그러면 새끼 낳을 집 완성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30대 초반 전국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자연과 친해졌다. 어릴 적 산골오지에서 살면서 형성된 원형질이 이 경험을 계기로 발동했을 것이다. 생태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곤충과 친해지고, 결국 딱정벌레를 공부하러 생물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어 박사과정에서는 ‘버섯살이 곤충’을 연구했다. 꺾어진 개망초가 어디 없나 “자연 세계에는 해충이란 결코 없습니다.” 곤충을 바라보다 보니 곤충의 입장에서 자연이 바라보아진다. 각 글의 말미에는 곤충이 인간에게 해충으로 비쳐 박멸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데 대한 단상이 들어 있곤 하다. 썩은 나무를 먹이로 하는 꽃하늘소는 나무가 썩으면 바로바로 치우는 공원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잡초로 취급돼 농약의 공격 대상이 되는 소리쟁이속 풀이 없어지면 그것만 먹고 사는 좀남색잎벌레는 어떻게 될까. 잎을 에두르거나 지그재그로 잎맥 속을 기어다니는 광부곤충을 해충으로 취급해 박멸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많은 포식 곤충은 어떻게 될까. 족도리풀은 그늘진 숲 바닥에서 자라는데 그런 땅이 자꾸 사라진다. 휴양림, 삼림욕장, 야생화 관찰로 등이 들어서면서 더 나빠진다. 다 햇볕 쨍쨍한 길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족도리풀을 찾아 애호랑나비 어미는 더 먼 길을 가야 하려나 보다. 얽히고설킨 먹이그물에서 인간이야말로 해충이다. 봄이 오면 식물 옆에 나무 옆에 쪼그려 앉아보자. 꺾어진 개망초는 없나, 풀잎을 들춰보자. 화들짝 놀라지 말고 눈에 힘을 주자. 따뜻한 봄이면 까맣고 노랗고 빨간 것들을 오랫동안 쳐다볼 만하겠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