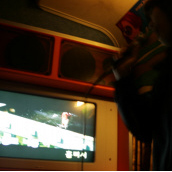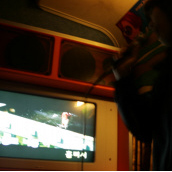새마을호 노래방 ‘나만의 콘서트’
등록 : 2009-08-03 18:41 수정 : 2009-08-07 11:51
힘든 날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어쩌면 나는, 당신은, 우리는, 매일 밤 퇴근길에 떠·나·고·싶·다·고 읊조려왔는지 모른다. 그날도 그랬다. 업무에 치이고 사랑에 힘들었던 어느 토요일 밤, 불현듯 나는 친구와 밤기차를 탔다. 장항선이었다.
뮤지컬 영화 <어둠 속의 댄서>에서 주인공 셀마는 퇴근길에 기찻길을 지난다. 공장 노동자인 셀마는 시력을 점점 잃어가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게 될까봐 숨죽이며 살아간다. 이 때문에 공장에서 기계 아래로 손을 넣을 때도, 퇴근길에 기찻길을 지날 때도 아슬아슬하다. 한데 셀마는 어느 순간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느낀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덜컹대는 기차 바퀴 소리…. 쿵칙칙 뿅툭툭 펑. 모든 리듬이 기가 막히다. 리듬이 잡히면 셀마는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춘다. 그럴 때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길쭉한 미소를 짓는다. 그의 눈앞엔 환상적인 뮤지컬 무대가 펼쳐진다. 누군가 묻는다.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나요? 그가 대답한다. 볼 게 뭐 있나요.
기차에 오르니 셀마처럼 가슴이 두근댔다. 마침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툭툭툭툭툭. 비는 음악이다. 기차가 출발하고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서 저마다 뭔가에 몰두한다. 내겐 음악이 필요했다.
그동안 KTX 타고 ‘빨리빨리’만 외쳐왔는지 새마을호는 오랜만이었다. 새마을호는 널찍한 좌석과 카페칸을 자랑했다. 일찌감치 친구와 카페칸으로 옮겨 앉았다. 카페칸 좌석은 창문을 향해 일렬로 배치돼 있다. 둘이 나란히 앉으니 창문에 우리 얼굴이 비친다.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다.
MP3를 뒤적이며 서로의 추천곡을 들었다. 아무 일 없이, 흔들리듯 거리를 서성이지, 우연히 널 만날 수 있을까.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을 조규찬이 다시 부른 곡을 들으며 주책맞게 우리는 눈물을 찍어냈다. 유치하다 얘, 다른 노래 듣자,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좋지 않니, 근데 결혼이 꼭 사랑의 완성일까, 수다도 끝이 없었다.
음악을 듣다 보니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다. 셀마처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고 싶어졌다. 카페룸 구석을 보니 ‘미니 콘서트룸’이 있다. 노래방이란다. 10분에 2천원, 30분에 5천원. 기차에서 내릴 시간이 다 돼 급한 대로 10분만 신청했다. ‘미니 콘서트룸’에 들어서자 웃음이 났다. 룸 안에는 기차 좌석 두 개가 어색하게 눕혀져 있었다. 좌석에 앉으면 모니터와 마주 보게 된다. 오른쪽 옆은 차창이다. 비가 오는 창밖 풍경, 달리는 열차, 그리고 노래방.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자리에 모였다.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 춤도 줬다. ‘10분의 행복’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밤 11시. 낯선 도시다. 기차역을 나서니 비가 더 거세게 내렸다. 역 앞에는 하얀 택시만 길게 줄 서 있다. 수천 개의 물방울이 택시 표면에 닿았다가 튀어오른다. 그 완벽한 리듬에 빠져들었다. 그래서다. 밤기차는 음악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