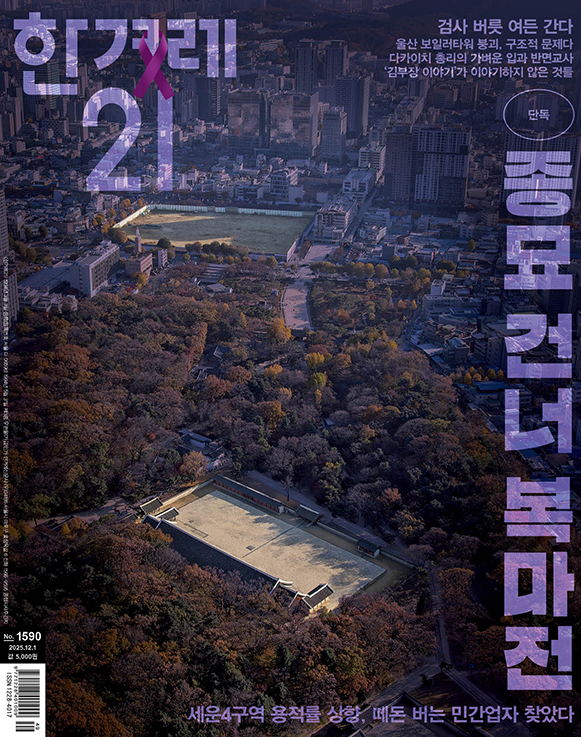주목받는 차세대 연료로 차량 저장탱크 개발… 생산단가 낮추면 수소 경제 실현
(사진/아직까지 수소자동차는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현대-기아차가 시험제작한 수소자동차(맨위)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300헤미) 인구 27만여명의 조그마한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세계에 묻혀 있는 1조억배럴이 넘는 석유가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석자원에서 탈출해 ‘수소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야망을 키우고 있다. 아랍 산유국들을 대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대신하는 ‘수소생산국기구’(HYPEC:The organizatin of Hydrogen Producing Countries)를 설립해 수장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북반구의 바레인’을 꿈꾸는 아이슬란드의 신에너지연구자들은 수도 레이캬비크 도심에 떠도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을 말끔히 씻는 게 2020년이면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이슬란드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는 수소에너지를 사용해 자동차는 물론 건물의 난방까지 해결해 스모그와 온실가스 등을 완전히 추방하려고 한다. 21세기형 에너지인 수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공해물질 없는 21세기형 청정에너지원
그렇다면 왜 아이슬란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선택한 것일까.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넘볼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매장지가 중동 등에 밀집된 것과는 달리 수소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물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수원지 확보 전쟁이 벌어질 염려도 없다. 물의 전기분해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생가능하다. 어느 나라든 기술력과 경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OPEC처럼 막강한 힘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기구도 나타나기 힘들다.
또한 수소는 연소할 때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이다. 화석연료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스모그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지만 수소는 친환경적이다. 수소를 연소해 물이 되는 과정에서 공기중의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 극소량의 질소산화물이 생성되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미 수소는 산업용 기초소재에서부터 일반연료, 자동차, 비행기, 연료전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꿈으로만 여겼던 맹물로 가는 자동차이다. 실험실에서 엔진에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은 속절없는 바람이 아니다.
수소가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연구자는 현재 거의 없다. 그렇다고 수소가 다루기 쉬운 에너지원인 것은 아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수소 저장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데 따른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한다. 현재 차량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가솔린이나 천연가스 등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37년에 발생한 수소 추진 비행선 힌덴버그의 공중 폭발 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3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당시 수소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1997년에 사고의 원인이 비행선의 인화성 외장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소가 비행선 폭발의 주범이라는 오랜 불명예를 씻은 것이다. 그럼에도 수소의 파괴력은 여전히 두려움을 안겨준다.
수소를 얻는 데 따른 경제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론적으로 수소가 아무리 무진장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수소가 천연가스처럼 곧바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 탓이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어야 한다면 공정상에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효용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받는 물질은 생물체의 수소발생효소를 닮은 ‘광촉매’이다. 예컨대 빛을 흡수해 물을 분해하면서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드는 식물의 엽록체를 닮은 촉매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다. 만일 수소발생효소의 활성을 그대로 닮은 화학적 광촉매가 영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진장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 독일, 일본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반도체 물질을 사용해 태양에너지에서 수소를 얻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수소자동차의 실용화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소 저장매체이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저장방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연기관에 수소를 분사하는 방식의 자동차라면 사정이 다르다. 현재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압축해 고압상태에서 저장하는 고압수소탱크, 액화해 극저온상태에서 저장하는 액체수소탱크, 특수금속의 가역반응을 이용한 금속수소화물(metal Hydride)탱크 등의 방식이 있다. 고압수소탱크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폭발 위험이 높아 차량에 탑재하기 힘들다. 로켓연료로 이용되는 액체수소는 발열과정 등에 고급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이 힘들고 저장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용 수소 저장탱크는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한 방식이다.
금속수소화물은 금속과 수소가 가역적으로 반응해 수소화물(Hydride)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을 이루는 것을 일컫는다. 수소는 적절한 금속을 만나면 금속 내 격자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액체수소보다도 더 밀집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 금속수소화물의 부피당 저장량은 놀랍게도 액체수소형태의 저장 방법보다 1.5∼2배나 높다. 물론 모든 금속이 수소와 결합해 수소화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희토류금속, 그리고 전이금속 일부가 수소화물을 이룬다. 여기에 일부 금속성 물질이 합금으로 쓰여 금속수소화물을 만들게 된다.
저장매체 내구성 불완전… 생산단가 낮춰야
(사진/수소자동차는 내구성이 탁월한 금속저장탱크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사진은 수소자동차모델과 내부모습) 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수소자동차를 위한 금속수소화물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안전성이 높을지라도 중량과 내구성이 흠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자동차용 수소 저장매체로 금속수소화물을 사용한 최초의 시도는 미국 브룩헤이번 국립연구소(BNL)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소는 1967년에 개발을 시작해 1974년에 철티타늄?? 합금을 이용한 금속수소화물을 만들어 수소자동차 모델을 선보였다. 수소화물을 이용한 승용차·밴용 수소 저장장치를 개발하는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최근까지 10여대의 차량을 이용해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자동차 업계는 2020년 무렵이면 신차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연료전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현대자동차는 1998년에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한 수소자동차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소 경제 실현의 최대 걸림돌은 수소의 가격경쟁력이다. 미국에서 수소 1리터의 가격은 1.80달러에 이른다. 이에 비해 휘발유는 세전가격이 29센트 안팎이다. 수소 연료전지라 해도 시설투자비가 엄청나다. kW당 8천달러가 넘어 3500달러/km인 원자력, 600달러/km인 화력 등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수소화물을 이용한 자동차는 주행거리면에서도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아직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아무리 배기가스가 깨끗하고 엔진에서 남은 에너지로 실내 냉난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해도 수소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충전소나 가정으로 전달되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소 경제는 화석연료의 고갈을 앞두고 언젠가 실현될 게 틀림없다. 어쩌면 수소시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와 수소 경제를 선언한 아이슬란드를 더욱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지도 모른다.
도움말 주신 분
이석재 현대자동차 가솔린엔진시험팀 책임연구원, 최윤석 삼성전관(주)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수병 기자
soo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