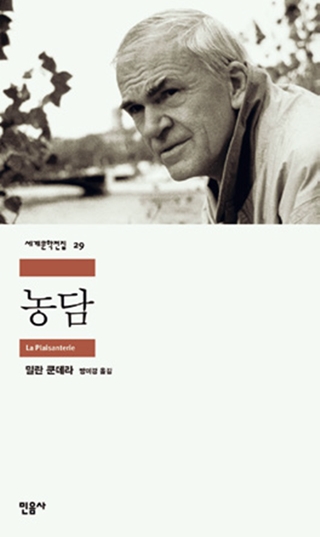
어떤 젊은이는 미워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를 미워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워할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필연적인 것은 미움과 대상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미워할 대상이라는 자리다. 젊은이는 먼저 미워할 사람을 간절히 요구하고,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다음에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물색한다.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주 우연히, 맹목적으로 선정된다. 사후에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나면 나라 안의 분쟁이 잠잠해진다. 사람들이 서로 반목할 때 희생양이 등장하면 그 희생양에게 모든 폭력적 에너지가 집중되어 사회가 평화로워진다. 이처럼 폭력적 에너지는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고, 그러면 내부가 무사해진다. 마찬가지로 젊음을 버텨내는 동안 불가피하게 느끼기 마련인 불안, 외로움, 자괴감 등 심적 고통은 공격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것은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주인을 해친다. 이때 그 어두운 감정이 달라붙을 바깥의 기둥이 필요하다. 하여 젊은이는 자꾸만 그것을 투사할 대상을 물색한다. 젊은이는 자기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할 타인, 자기 불행을 대신 책임져줄 타인을 찾아헤맨다. 친구, 부모, 교사, 사회, 때로는 세계 전체, 그 누구든 자기 불행의 탓을 그에게 돌리고 그를 원망하면서 허다한 괴로움을 잊는다. 무엇보다 괴로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과 자신이 결국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벗어버린다. 성장은, “내가 부당함에 보복하려 했던 모든 곳에서, 마침내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로 색출해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찌하리오. 모호하고 막연한 적의를 지팡이 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젊은이의 짐이 무겁고 무겁다면. 모든 곳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나 바람둥이 냉혈한인 루드비크는 오로지 루치에만을 사랑했다. 유배 시절 그녀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만큼 루치에 그리고 그녀와의 육체관계는 절박했다. 그는 그녀와 육체관계를 맺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거듭 저항에 부딪혔다. 눈물겨웠던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하자 그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녀는 종적을 감추었다. 훗날 루드비크는 당시의 진실을 알게 된다. 그를 사귀기 전에 그녀는 윤간당한 적이 있고, 육체관계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통절히 깨닫는다. “실은 나는 루치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토록 여러 해 동안이나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모습을 그려왔”다고. 그의 눈에 비친 루치에는 커다란 사랑을 받고도 납득 못할 배신을 저질렀다. 진짜 루치에는 윤간 트라우마로 고통받은데다 루드비크로 인해 더욱 처참한 상처를 입었다. 두 명의 루치에 사이에는 치명적인 거리가 있다. 그가 알던 루치에는 상상의 산물, 그의 내면을 투사한 이미지, 그의 분신일 따름이었다. 그가 그녀의 현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만의 상상에 더욱 몰두했기 때문이다. 젊은이에게 세상은 자기를 투영한 거울이다. 젊은이가 누군가를 숭배할 때, 숭배의 이유는 종종 젊은이가 자신의 기대, 이상, 판타지를 투사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가 누군가를 혐오할 때, 혐오의 이유는 젊은이 내면의 그늘을 암시한다. 그는 자기의 결점이나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혐오한다. 젊은이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하물며 젊은 날의 연애는 사랑과 이성에 대한 고독한 판타지가 넘쳐나는 장이다. 루드비크는 정숙하며 고요한 성품의 여자, 자기로 하여금 사랑에 몰두하게 할 여자, 자신을 구원할 여자가 필요했다. 그 필요에 따라 루치에를 그런 여자로 상상했다. 판타지로 루치에를 덮어씌우고 그녀의 현실을 각색했다. 그는 사방팔방 자신에게 포위되어서 타인을 바로 보지 못했다. 젊은 시절은 “자기 밖에 놓인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너무도 커다란 수수께끼인 그런 나이, 또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혼란, 자신의 가치 등을 놀랍게 비추어주는 움직이는 거울에 불과한 그런 바보 같은 서정적 나이”란다. 젊은이는 자신을 너무나 알고 싶으나 그 무엇보다 알기 어렵다. 자기 자신은 가장 매력적이지만 진정으로 난해한 수수께끼다. 하여 자기에게 과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바깥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무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알고 싶은 지나친 열망은 자신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무지를 낳는다. 루드비크는 루치에에게 사랑받았다고 믿었으나, 실은 조금도 사랑받지 않았다는 진실을 훗날에야 알게 된다. ‘사랑받았던 나’는 루드비크가 상상한 ‘나’지만, 실제의 ‘나’ 혹은 루치에가 바라본 ‘나’는 그 반대였다. 자신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젊은이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른다. 젊은이는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자기의 시각과 판단을 맹신한다. 세상이 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보일지 바꾸어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본 자기’와 ‘남이 본 자기’가 동일하다고 믿어버린다. 모든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논평하지만, 자기가 세상에게 어떻게 논평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박수현 문학평론가·공주대 교수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